력사를 찾아서
북위(선비) (3) 정복왕조 출현의 전조(前兆): 흉노의 쇠퇴와 만주 선비족의 등장/ 2원통치조직의 창시: 모용선비의 연(燕) 정복왕조(北魏) 출현의 예고/이원통치체제의 유지: 첫 정복왕조 북위(拓跋鮮卑 北魏)의 출현 본문
북위(선비) (3) 정복왕조 출현의 전조(前兆): 흉노의 쇠퇴와 만주 선비족의 등장/ 2원통치조직의 창시: 모용선비의 연(燕) 정복왕조(北魏) 출현의 예고/이원통치체제의 유지: 첫 정복왕조 북위(拓跋鮮卑 北魏)의 출현
대야발 2025. 2. 15. 16: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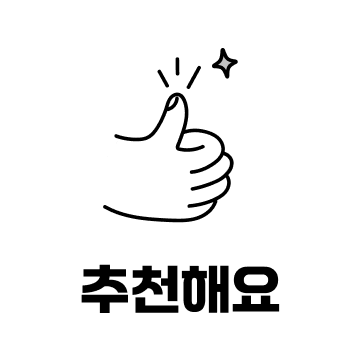
화평을 미끼로 한족들로부터 온갖 재화를 갈취 해 오던 몽골고원의 흉노족이 내분으로 몰락하고, 요서 초원의 소위 동호(東胡)라는 선비(鮮卑)족이 대체세력으로 나타나, 중국대륙에 본격적인 이민족 정복왕조의 등장을 예고하게 된다.
후한(後漢, 25-220)을 세운 광무제(光武帝, 25-57)는 중국 남부와 월남의 북부를 다시 정복했다. 기원전 209년에 묵특의 지휘아래 유목제국을 수립한지 250여년이 지난 AD 47년, 흉노제국에 내란이 일어나 몽골초원 전체가 산산조각이 났다.
덕분에 요서 초원지대의 오환(烏桓)과 선비(鮮卑)는 제일 먼저 흉노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물실호기, 후한 명제(明帝, 57-75)는 전한 무제를 본받아 흉노를 다시 한번 통제해 보려 했다.
일찍이 AD 48년에 흉노제국이 남과 북으로 양분되자, 조정관료인 장궁(臧宮)은 흉노의 약세를 틈타 “고구려,” 오환, 및 선비와 연합하여 흉노를 공격하자고 주장했었다. 당시 광무제는 전쟁을 반대하는 자신의 신조를 강하게 피력했다.
49년, 광무제는 푸짐한 선물과 국경무역을 제공해 선비족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였다. 명제가 즉위한 다음 해인 58년 이후에 후한 조정이 선비 부족장들에게 정기적으로 갖다 바친 금액은 년간 2억 7000만냥에 달했는데, 그 규모는 같은 기간 동안 남흉노에게 바친 것의 세배에 달하였다.
드디어 화제(和帝, 88-105) 즉위 직후인 89-93년 기간 중, 선비-남흉노-후한의 연합군이 오르콘 지역의 북흉노를 섬멸했다 살아남은 흉노 중 일부는, 몽골고원으로부터 계속 서쪽으로 달아나 발카하쉬와 아랄 초원지대를 경유해 러시아 남부 초원지대에 까지 이르렀다.
이들 서방으로 달아난 흉노는 역사에서 사라졌다가, 그 후손들이 “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타나, 374년경에 볼가강과 돈강을 건너 로마제국을 침공했다 441년부터 아틸라의 지휘를 받아 유럽대륙을 유린 하다가, 아틸라가 453년에 죽자, 훈족은 러시아 초원지대로 철수했다.
선사시대에 인도 북부와 이란에 정착했던 아리안족은 서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갔다. 아리안족은 기원전 1500년경에 인더스계곡으로 내려와 모헨조다로의 드라비다 문명을 파괴해 버렸다 그 잔혹상은 옛 인도의 대서사시인 마하바라타에 선명하게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아리안족은 기원전 7세기-3세기 기간 중에는 스키타이라는 이름으로, 또 그 이후에는 여러 다른 이름으로 남부 러시아와 시베리아 서부의 목초지대를 점거하였다.
흉노족부터 시작해 후대에 몽골고원의 투르크와 몽골족들이 계속 서방으로 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아리안족과의 혼혈이 심화되었다. 난폭한 관행 탓에 역사적으로 여자들은 남자들 보다 유전적 유동성이 훨씬 높았다.
기하학적 형상으로 정형화된 스키타이 동물 예술품은, 동물형상을 주제로 정형화된 오르도스 흉노 예술품과 마찬가지로, 모두 신변장식용이었다 스키타이족과 흉노족들은 말을 타고 활을 쏘며, 고기만을 먹고, 천막 속의 모피 위에서 잠을 자며, 술잔으로 쓰기 위해 적의 두개골을 사냥했다.

만주 서부의 선비족들은 흉노족의 내란 덕분에 독립을 되찾고, 잔존 북흉노족의 대다수와 그들 영토를 흡수 병합하였다. 퉁구스족에 비해 선비족의 문화가 몽골(혹은 투르크)적인 것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비족의 전통은 흉노족과는 달리 선출된 지도자가 제한된 지휘권만을 갖는 약한 부족연맹체였다. 크고 적은 부족장들은 이따금 개성이 강한 지도자의 영도 하에 단합을 하기도 하지만, 흔히 이들 작은 부족들은 자치권을 행사하면서 제가끔 중국 왕조의 조공체제에 개별적으로 가입했다.
통치권이 세습되고 중앙집권화된 흉노족의 체제와는 달리, 선비족은 세습보다는 평등적 정치체제를 강조하였다. 북흉노의 쇠망이 묵특에게 정복당했던 선비 세력의 재기를 가능케 한 것이다.
후한 조정은 중소 선비 부족장들과 기꺼이 직접 거래를 했다. 많은 부족장들에게 그럴듯한 칭호를 수여하고, 각종 물자를 제공 함으로서, 유목민 부족들의 분열을 조장하려 했다. 변경지역의 한족 관리들은 중소 부족장들에게 지위에 걸맞은 칭호와 선물은 물론, 교역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면서, 그들이 개별적으로 조공체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질투심이 강한 수많은 부족장들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중국 조정의 보조금을 얻을 수 있도록 개별적인 거래를 하는 전략을 구사 해, 선비족 중소 부족장들 스스로가 초원지대의 단결과 중앙집권화를 반대하게끔 유도했던 것이다.
Barfield (1989: 85)에 의하면, 후한 시대인 AD 108년 당시, 선비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중소 부족들은 120 개에 달했으나, 흉노의 이름으로 기록된 부족들의 수는 초원지역 전체를 통해 20여 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선출된 선비족 지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 부족이 통합된 군사작전을 벌려 중국을 침략하는 것이 부족간의 단합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책이었다.
당시 선비족이 채택한 전략은, 흉노와 마찬가지로, 중국본토를 야만적으로 습격해서 약탈을 한 다음 초원지대로 퇴각을 하는 것이다. 보상금 혹은 교역량을 크게 하기 위해 전쟁과 평화를 반복하고, 수적인 열세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중국본토를 점령하지 않았다.
공세적인 군사전략은 무관과 상인들의 출세 기회를 확대했기 때문에, 유교전통으로 훈련된 중국 조정의 문관들은 이를 반대하였다. (Jagchid and Symons, 1989, p. 54). 문신들은 진시황과 한무제가, 쉽게 평정 할 수도 없고, 중국에 편입시킬 수도 없는 땅을 놓고 흉노와 벌인 전쟁을 아주 졸렬한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조공 형식으로 포장한 유화정책을 통해 화평과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문관들은, 유목민들과 끊임없이 싸우기 보다는 그들에게 물자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좋은 전략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AD 300년 이후에 북중국을 정복한 만주 출신 정복왕조들이 채택한 전략은, 한족 조정의 전략과는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에, 몽골고원의 투르코-몽골 유목민들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다.
한족 왕조들이 흉노에 이어 선비 등 유목민들과 대치한 시기(BC 206-AD 316)는 로마제국이 게르만 민족과 대치하고 있던 시기와 대충 일치했다(BC 272-AD 395).
실크로드로부터 물자를 갈취하는 흉노를 좇아내기 위해, 후한(後漢) 조정은 반초(班超)와 그의 아들 반용(班勇)을 파견하여 94-127년 기간 중 타림분지 전체를 정복했다. 그 결과, 서역으로 가는 길이 열려 불교와 그레코-헬레니즘 양식의 간다라 예술이 전파되었고, 유라시안 대륙의 서쪽 끝과의 교류도 증진되었다.
따뜻한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로마제국은 소빙하기 (小氷河期, BC 400-AD 300) 전반을 통해 번영을 구가했으나, 4세기, 지구 온난화 회복시작에 동반된 가뭄은 온갖 종류의 북방 야만족들이 준동하게 만들었다.
4세기는 북중국에서 5호16국시대(304-439)가 시작되는 시기와 일치하며, 유럽에서는 게르만민족의 대이동(374-453)과 일치한다. 로마 사람들한테 흉노 노릇을 하고 있던 게르만족들은, 4세기 초, 라인강으로부터 흑해에 걸쳐 전 로마제국 북방 국경선에 포진을 하고 있었다.
374년 이후의 훈족 침입은 연쇄반응을 촉발했다 미친 듯이 쫓는 훈족과 정신 없이 쫓기는 게르만족들에 의해 유럽전체가 황폐화 되었다.
Lamb(1995: 160-1)은 “우리가 카스피해 수면 높이의 변화와, 간헐적 강과 호수, 그리고 신강과 중앙아시아의 유기되어 버려진 거주지들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4세기에 들어 한발이 극에 달해 실크로드 통행은 정지 상태에 빠졌었다 이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의 생활터전인 목초지대를 휩쓴 가뭄이, 야만 유목민족들과 그들에 쫓겨 떠돌이 신세가 된 종족들로 하여금, 서쪽 유럽대륙으로 밀려가는 연쇄반응을 촉발 해, 마침내는 로마제국을 쇠퇴시켰다는 Huntington의 (1907년)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홍원탁교수, 동아시아 역사 8. 정복왕조 출현의 전조(前兆): 흉노의 쇠퇴와 만주 선비족의 등장, Fall of Xiong-nu and Rise of Manchurian Nomad Xianbei Replacing Xiong-nu, 2005.02.17
4세기 5호16국 시대에 모용외와 그 후계자들은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정주 (漢族) 농민을 다스리는 관료적 행정조직과 (鮮卑族) 유목민을 다스리는 부족적 군사조직을 분리한 2원적(二元的) 통치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를 세웠다.
요서 초원지대는 부족 전통에 따라 군사적으로 조직을 하고, 요하 유역에 거주하는 농민과 도시민들은 중국식으로 문관이 다스리는 2원제도를 운용했다.
북위, 요, 금, 원, 청 등 후대의 모든 이민족 정복왕조들은 모용선비(慕容鮮卑)족이 창안한 2원제도를 개선 발전시켜 중국 대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복하고 통치했다.
모용선비 전연은, 359년에 중원을 점령한 후, 특이하게 빠른 속도로 중국화 되었다.
360년, 150만 명의 한족(漢族) 오합지졸을 징집해 남쪽의 동진(東晉)과 서쪽의 전진(前秦)을 정복하려 했다.
370년, 전연은 부견(符堅)에 의해 멸망되었다. 하지만 전연은 365년에 낙양을 점령했었고, 단기간이나마 북중국 일대를 점령하여, 본격적 정복왕조인 북위(北魏, 386-534) 출현의 전조가 되었다.
상황판단이 빠르고 혁신적인 만주 유목민-삼림족들이 중국식 관료조직의 효율성과 자신들 고유의 군사적 장점들을 모두 취합하는 이원적 통치체제를 만들어 중국대륙의 심장부를 정복하고 지배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재는 영문과 국문번역을 동시에 제공한다.

홍산문화 (紅山, 4,000-3,000 BC) 이후의 남만주 문화의 발전과정은, 특히 상나라에 앞섰던 하가점 하층문화(夏家店下層, 2,000-1,500 BC)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분명한 연속성을 유지하였다. 소위 주 무왕이 소공(召公)에게 기원전 1027년에 봉해주었다는 북연(北燕)은 전국시대(403-221 BC)에 와서야 비로서 중국왕조 역사에 분명하게 나타난다.
민족, 언어, 문화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북)연이 기원전 311년경에 정복을 했다는 란하(灤河), 대능하 (大凌河) 주변의 요서지역은 원래 중국적인 요소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목민적 성격이 강한 청동기 하가점 상층문화(1100-300 BC)는 하북지역의 연 왕국(1027-222 BC)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홍산문화를 공유하면서 알타이 계통 언어를 사용했던 원시 선비-예맥족들이 바로 요서지역 전체의 주 구성원 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연은 기원전 222년에 진 시황제에게 정복되었다. 그런데 사기를 보면, 묵돌이 기원전 209년경 흉노부족을 통일하고 선우가 될 무렵, 선비족의 세력이 전성기에 달했던 것 같다. 하지만 선비족은 바로 이 신흥 흉노 제국에 복속되고 만다.
선비족들은 2세기 중, 단석괴(檀石槐, 156-81)의 영도 하에, 짧은 기간이나마 하나의 제국을 이룩했었다. 이 단명의 선비제국은 몽골고원의 흉노 세력을 일시적으로 대체했었다. 그 후, 한 동안 약세 이었다가, 한족 왕조들이 쇠퇴함에 따라, 4세기에 모용선비 연(前燕, 349-70; 後燕, 384-408; 西燕, 385-94; 南燕, 398-410) 왕국들을 세울 수 있었고, 5세기에 와서는 최초의 북중국 정복왕조인 탁발선비 북위(386-534)를 세우게 되었다.

후한의 쇠망은 184년 황건적의 난으로 시작된다 188년에 영제(靈帝)가 죽은 후, 한의 통치자들은 지방 군벌의 꼭두각시가 되었다. 요동은 190년부터 238년까지 공손씨 (公孫度, 公孫康)에 의해 점거되었는데, 이들은 196-220년 기간 중 낙랑군 남쪽에 대방군을 설치하였다. 연(燕)왕이라 자칭하던 공손연(公孫淵)는 조조(曹操)의 위(魏)나라 원정군에 의해 239년에 살해당하였다.
중국의 삼국시대(三國, 220-265) 기간 중에는 선비의 작은 부족장들이 위 조정과 개별적으로 흥정을 하면서 변경의 많은 지역을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였다. 위 조정은 국경 밖의 유목민에게는 후한 보조금을 주면서 국경무역을 허락하였고, 국경 안의 부족들에 대해서는 간접지배 정책을 유지하였다. 단명의 서진(西晉, 265-316) 역시 위의 정책을 답습하였다.
285년에 모용선비 부족장이 된 모용외(慕容廆, r.285-333)는 곧바로 부여를 공격했다. 286년에는 (기원전108년에 한무제가 고조선을 정복 한 이래 한족들이 정착한) 요하 유역의 농경지대를 공격했다. 요하 유역은 중국이 통일되면 한족 제국에 흡수 통합이 될 수도 있었지만, 무정부상태의 혼란기에는 제일 먼저 중원의 제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지역이었다. 하긴 중국대륙의 한족 통치자들 역시 동북 변경지대를 그리 중시하지 않았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자치권을 주었었다.
291-305년 기간 중, 중국대륙 전역에 내란이 일어났다. 위와 서진의 볼모정책 덕분에 중국 황실 내에서 성장하고 중국화된 새로운 유형의 흉노족 지도자가 선우가 되어, 311년에 낙양을 함락시키고 황제를 사로잡아 서진을 유린했다. 316년에 장안이 함락되자 진 황족의 일부는 남쪽으로 달아나, 317년에 양자강을 장벽으로 삼아 건강(建康, 지금의 南京)에 수도를 정하고 동진을 세웠다. 5세기에 게르만족에 의해 황폐화된 로마를 콘스탄티노플이 대신하였던 것처럼, 남경은 589년까지 장안과 낙양의 역할을 대신했다.

▲ Former Yan Art Objects from the Zhaoyang-Beipiao area: (top) gilt-bronze saddle plates; (second) gold hat ornaments with disk pendants; (third) gilt-bronze horse ornament; and (bottom) bronze deer-shaped object Watt, et al. (2004: 124, 130)
Ledyard(1983: 331)는 “317년”을 중국 역사상,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하나의 분기점으로 이해한다. 중국 대륙의 주요 부분이, 아니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족이 아닌 이민족에 의해 점령된 역사적 전환점이 바로 317년 이라고 생각한다.
흉노족이 북중국에 처음으로 세운 전조(前趙, 304-329)는 너무 중국식이었기 때문에 몽골 초원지대의 토박이 흉노 부족들로부터 호감을 사지 못하고 내분의 씨앗을 키웠다. 반대로, 두 번째 조나라(319-349)는 지나치게 흉노식이였기 때문에 중국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었다. 마지막 흉노왕의 아들은 후궁 하나를 식탁에서 구울 정도로 극악무도했다 한다.
당시 만주의 선비족은 더 이상 순수한 유목민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상당기간 요하 유역을 점령하여 농민과 도시민을 지배해왔었다. 선비족은, 요서 초원지대는 부족 전통에 따라 군사적으로 조직을 해 다스리고, 요하 유역에 거주하는 농민과 도시민들은 중국식 문민 관료제도로 다스리는 2원(二元)적 통치조직을 운용했다.
문민 관료는 절대로 부족들로 구성된 군대의 지휘관이 되지 못하였다. Barfield(1989: 97-99, 106)에 의하면, 모용 선비가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5호16국 시대(304-439)에 (정주 농경지역에 대한) 관료적 행정조직과 (목초지 유목민을 상대로 하는) 부족적 군사조직을 분리한 2원적 통치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를 세운 것이다.
모용 선비족은 그들 자신의 독립국가를 수립하기 이전에 여러 세대에 걸쳐 중국 국경 안에서 중국의 문화를 흡수하면서 살았었다. 모용외는 국가를 세워 기초를 다질 때, (모용씨의 국가를 한 개의 중화제국으로 발전시켜 보려는 의도를 가진) 수많은 중국 관리들과 학자들의 조언과 협조를 얻을 수 있었다.
한족 자신의 사마씨 황실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면서도 흉노의 지배에는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수 많은 중국 관료들이, 당시와 같은 정치적인 혼란기에, 요동 땅의 작은 나라에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던 모용씨 측에 가담했다. 그들은, 중국식으로 교육을 받은 모용선비 지배자를 통치자로 모시면서, 이상적인 중국식 조정을 조직하고, 모용씨의 국가를 점차 서쪽으로 또 남쪽으로 확장 해 나가도록 도왔다. 모용외는, 중국식 행정규율과 정부 운영 조직을 도입하고, 자신의 군대에 훌륭한 무기와 갑옷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군사력을 크게 강화했다.
Fairbank(1992: 111-2)에 의하면, 한편으로는 중국적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목민적인 2원제도는 4세기부터 남만주 지역에서 출현하는데, 후대 몽골족과 만주족 정복왕조를 거치면서 거대한 제국 전체를 장악하고 지키는 통치체제로 완성되었다.
덕으로 다스린다는 유교적 신화가 있지만, 왕조의 출발 자체가 바로 군사력에 의한 것이고, 황제 중심의 전제적 체제는 지배자가 반란세력을 진압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가졌을 때만 존속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일단 왕조가 확립되면 관료체제는 결국 문관에 의해 운영되게 마련이다.
유교 전통으로 훈련 받은 문관이 군사전문가로 변신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개중에는 유능한 무관이 나오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군사기술은 유목 정복자들의 주 특기였다. 상황판단이 빠르고 혁신적인 만주 유목민들이 중국식 관료조직의 효율성과 자신들 고유의 군사적 장점들을 모두 취합하는 이원적 통치체제를 만들어 중국대륙의 심장부를 점령하고 지배하게 된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식 국가조직은 왕의 형제들을 봉토를 받는 친왕(親王)의 신분으로 만들어, 높은 지위를 즐기며 살게 한다. 실제로 중국 왕조의 친왕들이 흔히 봉토의 수입을 가지고 한가롭고 호사스런 생활을 영위했으나, 모용씨 왕의 형제나 아들들은 정부 내의 가장 중요한 직책을 부여 받았고, 모두가 다 군대의 장군으로 봉직했다. 전연(前燕)이 성취한 정복들의 거의 대부분이 왕의 형제나 삼촌들의 탁월한 전략과 지도력 덕분이었다.
모용외와 그 후계자들은 느슨한 연맹체 형태의 부족 집단을 이원적 통치체제의 국가로 변모시켰다. 15세에 족장이 된 모용외는 일직이 농업과 관료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국식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다. 그의 뒤를 이은 모용황(慕容皝, r.333-49)은 337년에 스스로 연(燕)왕이라 칭하면서, 유목민과 농경민 모두를 지배하였다.
연은 전국시대에 중국대륙 동북방에 있었던 왕조의 이름이었다. 모용 선비는 오늘날의 북경을 포함하는 하북성의 북부지역까지 강역을 확장하였다. Schreiber(1949-55: 378)에 의하면, 모용 선비족이 최초에 점거한 지역이 고대 연나라 영토와 거의 일치했기 때문에, 연이라는 이름이 부자연스럽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자명할 것이다.
모용선비가 352년에 중원을 정복하자, 모용씨 조정의 한족 관료들이 제일 먼저 모용준(r.349-60)에게 황제라 칭할 것을 권했다. 황제의 조정 형태가 되면 한족 관리들 자신이 좀더 높은 칭호의 직위로 승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권유를 한 것이다.
모용준이 360년에 죽자, 유능한 동생인 각(恪) 대신에 11세의 어린애인 위(暐, 360-70)가 제위에 올랐다. 중국화 현상이 너무 빨랐고, 결과적으로 전연 역시 빠르게 해체될 수 밖에 없었다. [후대의 정복왕조들이 중국화를 경계하게 된 반면교사 역할을 한 것이다.]
일찍이 모용준은 서부와 남부 전투에서 승리를 하자 남쪽의 한족왕조 진(東晉)과 서쪽 부견의 진(前秦)을 정복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359년 초, 모용준은 자신이 당시에 정복한 모든 주와 군에 명을 내려 군 복무가 가능한 한족(漢族) 장정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다음, 각 가구에 남자 한 명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장정들은 모두 징집하도록 명령했다. 모용준은 150만 명의 보병 대군을 자신의 지휘하에 확보할 계획이었다.
당시 전연 정부의 부패상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가는 대신 신소(申紹)의 상소문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상소문의 일부는 새로 징집된 군대에 관련된 내용이다: “과거 우리 궁사와 기병들의 용맹은 진(秦)과 진(晉)나라 사람들 모두가 두려워했었다. 우리 (鮮卑) 병사들은 언제나 구름같이 몰려들고 질풍같이 적에게 달려들었다.
그런데 어째서 요즘 (징집된 漢族) 병사들은 약속된 시간에 모이지도 않고, 전투에는 쓸모가 없는 것일까? 지방 관리들이 가난하고 약한자들에게 제일 먼저 군역과 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전장과 노역에 끌려 나가는 자나 집에 남아있는 자나 모두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 고통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모두 도망을 치고, 농사와 양잠을 돌보는 자가 없게 된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싸우려는 의지다.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병법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병사가 전투에 실제 참가하지 안을 때에는 평상시의 생업을 계속할 수 있게 허용되어야 한다”
섭정 모용각은 367년에 죽었다. 어린 황제는 정사에 관심이 없었다. 모용선비는 365년에 낙양을 점령했었으나, 370년에 부견에게 정복된다. 진서 편찬자들에 의하면, 연나라 말기에 병사들이 부패한 조정에 너무나도 실망을 했었기 때문에, 모용평(慕容評)이 [아무리 훌륭한 지휘관이었더라도] 죽기로 공격을 해오는 부견의 군대를 격퇴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Schreiber (1956: 125)는, “모용씨가 중국화 되자 한족 고위 관료들뿐만 아니라 남조(南朝)까지 모용씨를 존경을 했다”고 말한다. 얼마나 비꼬는 찬사인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중국: 황금시대의 여명 - 200년부터 750년까지”라는 주제로 (2004. 10. 12. - 2005. 1. 23.) 전시회를 열었는데, 오늘날 요녕성의 서부에 위치한 조양(朝陽)과 북표(北票) 지역에서 발굴되고 모용 선비 고유의 유물로 확인된 상당수의 청동기와 금동제품들이 전시되었다. 전시 내용을 책자로 펴낸 Watt(2004: XIX)등은 모용 선비의 예술품에 나타난 전형적인 도안 형태들을 얼마 후에 중국대륙의 북위와 한반도의 신라 예술품에서 다시 보게 된다고 말한다.

▲ Tomb Paintings of Farming unearthed at the (top) Zhao-yang area; (middle) Jiayu-guan 酒泉嘉峪關 area, Gan-su; and (bottom) 高台酪駝城 area, Gan-su.
조양에서 발굴된 한 쌍의 말 안장에 새겨진 (새와 다른 동물들을 품은 6각형들의) 투과형 문양은 모용 선비 고유의 기법인데, 후에 북위로 전파된다. Watt(2004: 125)등은, 이 문양이 같은 시대에 한반도의 동남쪽에 위치한 신라왕국의 한국사람들에 의해서도 채택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사실 이런 문양들은 신라에서만 채택된 것이 아니라, 가야에서도, 또 얼마간의 시차를 두고, 일본열도의 야마토 왕국에서도 채택되었다. 이러한 종류의 양식과 문양에 아주 익숙한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유물들이 선비족의 유적지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370년, 선비족의 연나라는 부견(苻堅)의 전진(前秦, 351-394)에 의해 정복된다. 부견을 흔히 탕구트(티벳)족 출신이라 하지만, 돌궐-몽골 계통의 지배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북중국 전체의 새로운 주인이 된 부견은, 동진(東晋, 317-420)을 정복하려고 남쪽에서 대규모 전쟁을 벌였지만, 383년의 비수(肥水)전투 패배로, 전진 왕조를 재기불능으로 만들었다.
탁발이란 이름의 선비족은 그들 본거지인 성락(盛樂)으로부터 병주(幷州)로 침입하기 시작하였다. 북위를 세운 탁발규(拓拔珪)는 398년에 만리장성을 넘어 산서성 북쪽으로 쳐들어와 평성(平城, 오늘날의 大同)에 수도를 정했다.
홍원탁교수, 동아시아 역사 9. 2원통치조직의 창시: 모용선비의 연(燕) 정복왕조(北魏) 출현의 예고, Commencing the Dual System: the Yan Kingdom of Mu-rong Xianbei, 2005.02.24
탁발 선비는 전연(前燕)이 만들어낸 이원통치 체제를 답습해, 처음으로 북중국 전체를 지배하는 이민족 왕조를 수립했다. 탈발규(r.386-409)는 모용선비 병사들을 자신의 군대에 흡수했고, 모용 선비족 지배층은 북위조정 내에 지배 귀족층을 구성하는 주요 씨족의 하나로 살아남았다.
북위의 문민 관료제도는 한족들 또한 탁발 조정으로 끌어들였다. 북위는, 한편으로는 정복한 중국 땅을 중국식 관료제도로 다스려 다른 유목민족에 대해 국력의 우위를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족중심의 유목민 전통을 바탕으로 부족의 정예들로 군대를 조직해서, 정복한 한족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시종일관 하게 유지할 뿐 아니라, 침략해 올 가능성이 있는 다른 유목민족들에 대해서도 군사적인 우위를 지킬 수 있었다.
모용선비가 시작하고, 탁발선비가 이어받은 2원적(二元的) 국가조직은 요(遼), 금(金), 청(淸) 같은 후대 정복왕조의 귀감이 되었다. 만주는 몽골족의 원(元)을 제외한 모든 정복왕조를 낳고 키운 산실이며 요람이었다. 선비족 예술의 특유한 양식은 북위의 평성(平城)시대 전반을 통해 지속되었고, 섬서와 녕하성에 자리잡았던 북주시대까지도 존속하였다.
탁발선비족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보면, 시베리아와 몽골초원 유목민들의 초기 예술적 전통의 흔적도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구려 고분벽화에 낯익은 사람들은, 섬서성에서 발굴된 갑옷을 입은 말 모양의 토기를 보고, 고구려 사람이 만든 토기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특히 호흐호트(呼和浩特)에서 출토된 말과 마부의 토기는 신라 토기로 오인될 정도다.
모용선비족 보다 더 후진적이었다는 탁발선비족
만주의 여러 부족들 중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해 가장 유목민적이었던 탁발 선비는, 전연(前燕)이 만들어낸 이원통치 체제를 답습해, 처음으로 북중국 전체를 지배하는 이민족 왕조를 수립했다. 탁발선비 왕국은 처음에 대(代)라 칭했다. 341년, 대의 지배자 시이지안(r.338-76)은 모용황(r.333-49)의 누이동생인 자신의 처가 죽자 황(皝)에게 또 다른 공주를 처로 삼도록 보내달라고 청했다.
모용황은 그 대가로 말 1천 필을 요구했다. 그러자 시이지안은 아주 무례한 태도로 거절을 했다. 343년, 모용황이 태자 준(r.349-60)과 평(評)에게 군사를 주어 탁발선비족을 공격하게 하자 시이지안은 부족을 이끌고 산 속으로 달아나 숨었다.
344년, 시이지안은 모용황의 딸을 신부로 맞이해 오도록 동생 질(秩)을 연나라에 보냈다. 몇 달 후, 모용황은 사신을 보내 자기한테도 공주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시이지안은 자신의 누이 동생을 황에게 시집 보냈다. 376년에 부견이 군대를 보내 대를 공격했을 때 시이지안은 무리를 이끌고 산속으로 달아나 숨어 있다가 죽었다.
시이지안의 손자인 탁발규(r.386-409)는 396년에 북위(386-534) 황제라 선포하고 모용선비 병사들을 자신의 군대에 흡수했다. 모용 선비족 지배층은 탁발 북위(386- 534) 조정 내에 지배 귀족층을 구성하는 주요 씨족의 하나로 살아남았다. 북위의 문민 관료제도는 한족들 또한 탁발 조정으로 끌어들였다.
탁발어와 선비어는 동일한 언어이었다. 북위는 후에 서위와 동위로 양분되고, 동위는 북제(550-77)가 된다. 북제(北齊) 때 쓰여진 안지추(顔之推)의 안씨가훈(顔氏家訓)을 보면, 북제 조정에 봉직하는 한족 관리가 선비 고관들의 눈에 들어 출세길이 열리도록 자신의 어린 아들에게 선비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온다.
탁발선비 지배층은 북중국을 정복한 후, 자신들 군대를 지휘할 때 계속 선비 언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후에 탁발 북위가 중국화 하자, 이들 군사 명령어(鮮卑號令) 중 많은 부분이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다. 탁발 선비의 언어는 아마도 거란어의 직계 조어(祖語)이었을 것이다.
이원제도의 유지
부족을 중심으로 하는 군대조직 덕분에 보급이 잘되는 기병대를 보유했던 북위는 초원지대 깊숙이 원정군을 보낼 수 있었다. 거의 모든 부족들은 부대 단위로 조직되어, 할당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국경수비 공동체의 구성원 역할을 하였다. 부족민과 군사에 관련된 문제는 각 부족 고유의 전통에 따라 처리되었다.
정복된 한족 거주지역은 한족 관료들에 의해 통치되었으나, 고위직은 대부분 선비 귀족들이 차지했다. 전통적으로, 한족들의 이상은 능력주의 사회인데 반해, 유목민족들은 세습적 귀족제도를 고수했다. 북중국 귀족가문들은 대부분 한족이 아닌 이민족 출신이었으며, 이들은 정복왕조 중앙정부의 고위직을 대부분 독차지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정복한 중국 땅을 중국식 관료제도로 다스려 다른 유목민족에 대해 국력의 우위를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족 중심의 유목민 전통을 바탕으로 부족의 정예들로 군대를 조직해서, 정복한 한족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시종일관 하게 유지할 뿐 아니라, 쳐들어 올 가능성이 있는 다른 유목민족들에 대해서도 군사적인 우위를 지킬 수 있었다.
모용선비가 시작하고, 탁발선비가 이어받은 2원적 국가조직은 요(遼), 금(金), 청(淸) 같은 후대 정복왕조들의 귀감이 되었다. 만주는 거의 모든 정복왕조를 낳고 키운 산실이며 요람이었다. Barfield(1989: 105)는 “한(漢)이 멸망하고 첫 번째 만주족 정복국가(탁발북위)가 등장하기까지는 150년이 걸렸고, 당이 망하고 나서는 75년이 걸렸으나, 명(明)이 망할 때는 거의 동시에 만주족 정복왕조가 들어섰다. 한족 왕조가 망하고 나서 정복왕조가 들어서기까지의 시간은 점점 단축되었지만, 그 방식은 똑같았다”고 말한다.
▲ Tomb Paintings of Ox Wagons excavated at the Zhao-yang area
한족 왕조들은 방어를 위해 장성을 쌓거나, 엄청난 선물과 교역특혜를 제공하거나, 대규모 공격을 반복하는 정책 중 하나를 택했었다. 그러나 북중국을 점령한 만주족 왕조들의 전략은, 적대적인 유목민 부족장들을 혼인정책을 통해 인척관계를 맺어 자기편으로 만들거나, 적대적인 부족들이 합심하여 동맹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경쟁관계에 있는 부족장들을 지원하거나, 성장 가능한 부족세력을 초장에 깨 버리는 방식이었다.
만주족 지배자들과 군대는 초원의 실상을 완전히 파악하기 때문에, 초원지대의 사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다. 만주족은 단순히 초원의 적을 패배시키기보다는, 주민과 가축들을 한꺼번에 모두 빼앗아 감으로서 유목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기반 자체를 붕괴시키려 했다.
439년에 북중국을 통일한 북위 태무제(太武帝, 423-52)는, 일찍이 429년에 오르콘강 유역의 유연(柔然) 몽골을 정벌할 때, “한족들은 보병이고 우리는 기병이다. 망아지나 암소 떼들이 호랑이나 늑대 무리를 어찌 당할 수 있겠는가? 유연 몽골은 여름철에는 북쪽에서 방목을 하고, 가을에는 남쪽으로 내려오며, 겨울이 되면 우리 국경을 침범한다.
우리는 그들이 여름철에 목초지에서 방목을 하고 있을 때 공격을 하면 된다. 숫말들은 암말을 쫓아다니고, 암말은 새끼들 돌보기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말들은 모두 쓸모가 없게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덮쳐서 그들을 목초지와 물가에서 쫓아내면, 며칠도 안돼서 모두 포로가 되거나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화 되고, 불교의 영향으로 무기력하게 되고
북위 조정이 마침내 중국화되고, 불교의 영향으로 무기력해지자, 국경정책도 옛 한족왕조들 모양으로 성벽을 쌓고 지키거나 유목민들에게 화평의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 되었다. 북위의 효문제(孝文帝, 471-499)는 중국식으로 황제중심의 전제체제를 확립한다며 정부 관직을 온통 한족으로 채우기 시작했고, 494년에는 수도를 선비족 고향에 가까운 평성(平城, 현재의 大同)에서 낙양으로 옮겼다. 그는 심지어 조정 내에서 선비 언어의 사용을 금지해버렸다.
▲ Xianbei Tomb Paintings(of Former Yan) excavated in 1982 at the Zhao-yang 袁台子 朝陽 area, across the Daling River, Liao-xi
효문제의 아버지는 수도승이 되기 위해 왕위를 버릴 정도로 독실한 불교신자였다. 북위의 지배자들은 애당초 유교적 편견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이 없이 불교를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으며, 그리스식 간다라 불교예술에서 영감을 얻어 그토록 신비한 모습의 거대한 (불상) 조각작품들을 만들었다.
Grousset(1970: 66)은 “포악한 전사들도 일단 보살의 자비심에 감화를 받게 되면, 인도주의적인 계율을 받아들여, 본래의 호전성을 잊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아예 자기방어 조차도 소홀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유목민 정복자들이 중국화 되어, 새로 나타난 유목민족에게 망하던지, 아니면 한족에게 쫓겨나게 되는 순간이 항상 찾아온다. Twitchett(1979: 97)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한때 북위의 국경선을 지키던 군 부대들은, 한족들이 하던 식으로, 범죄자들을 내다버리는 쓰레기장이 되었고, 관료들의 착취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한 반항집단으로 변했다. 마침내 524년에 북방의 국경지대를 수비하던 선비족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선비 예술의 특유한 형태
중국대륙 북부의 탁발선비족 유적지에서 발굴된 고고학적 유물들을 보면, 시베리아와 몽골초원 유목민들의 초기 예술적 전통도 발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선비족들이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 북부에 위치했던 옛 박트리아와 교류가 있었고, 로마 통치하의 중동과 교역을 했으며, 초기적 불상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와도 접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낯익은 사람들은, 섬서성에서 발굴된 (5호16국 시대) 갑옷을 입은 말 모양의 토기를 보고, 고구려 사람이 만든 토기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특히 호흐호트(呼和浩特)에서 출토된 (맨손으로 빚어 만든) 말과 마부의 토기는 신라 토기로 오인될 정도다. 한국사람들은 이런 모양의 토기에 너무나도 친숙한 것이다.
선비족 예술의 특유한 양식은 북위의 평성(平城)시대 전반을 통해 지속되었고, 섬서와 녕하성에 자리잡았던 북주시대 까지도 존속하였다.
534년에 북위는 동위와 서위로 갈라졌다. 이민족적인 요소가 훨씬 강했던 서위는 557년에 북주(北周, 557-81)가 되어, 577년에 북제를 정복하고 579년에 진(陳)의 강북 땅을 차지해,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북중국을 재통일할 수 있었다. 수(隋, 581-618) 나라는 선비족 북주의 후계자로서 천하를 통일한 것이다.
홍원탁교수, 동아시아 역사 10. 이원통치체제의 유지: 첫 정복왕조 북위(拓跋鮮卑 北魏)의 출현, Maintaining the Dual System: Northern Wei of Tuoba Xianbei, 2005.02.27
<자료출처>
'여러나라시대 > 북위(선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북위(선비) (7) 세계문화유산 운강(윈강) 석굴 (9) | 2025.02.19 |
|---|---|
| 북위(선비) (6) 고구려 출신 북위 문소황태후 고조용 묘지명 확인 (32) | 2025.02.18 |
| 북위(선비) (5) 고구려 금관이 선비족에 미친 영향 (10) | 2025.02.18 |
| 북위(선비) (4) 백제-북위 전쟁(488년~490년) (7) | 2025.02.18 |
| 북위(선비) (2) 선비족도 고조선의 한 갈래, 고구려와 형제 우의 나눠 (28) | 2025.0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