력사를 찾아서
북위(선비) (5) 고구려 금관이 선비족에 미친 영향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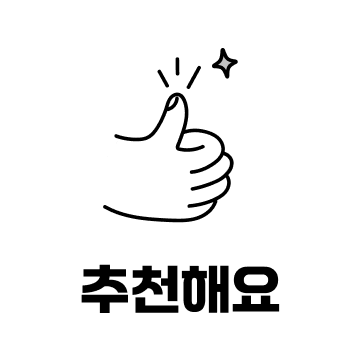
한반도와 만주지역 무덤들에서 출토되어지는 모든 유물들의 통시적인 양식사를 고찰하지 않은 채 중국학자들이 북연 또는 선비족 무덤이라고 한 내용을 비판과 분석 없이 받아들여, 한반도 남부와 만주 집안지역의 한국 고대 문화의 다양한 내용들이 삼연(三燕)문화 즉 북방문화의 영향으로 이루어졌다는 관련성으로 무분별하게 연결시켜졌다.
우리 문화를 보고도 우리문화인 줄 모르고 남의 문화라고 해놓고 거기서 다시 우리 문화의 원형을 찾고 있는 것이다. 왜 우리 민족문화의 원류를 한결같이 밖에서 찾아야 하는지 걱정이다.
평양성시기 고구려의 금관은 주변민족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요령성 북표현 서관영자에 위치한 북연 풍소불(馮素弗) 무덤 출토의 금제관식 및 금제관(그림 21, 22, 22-1, 23)과 내몽고자치구 달무기(達茂旗) 출토의 금제관식이다.



그림 21, 22, 22-1. 북표현 서관영자 북연 풍소불 무덤 출토 금제관식
요령성 북표현 서관영자에 위치한 석곽묘는 북연의 풍소불 무덤이라고 밝혀졌다. 풍소불은 오호십육국시대 후연의 모용운을 이어 왕위에 오른 천왕 풍발의 동생이다. 광개토대왕 17(408)년에 고구려는 사신을 보내 후연왕 모용운에게 종족의 예를 베풀어 화친을 맺었다.
모용운은 원래 고구려 사람으로 성이 고(高)씨였는데, 모용수의 아들 모용보가 태자로 있을 때 그를 양자로 삼아 모용씨 성을 하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에서는 그를 종족의 예로 대했던 것이며, 모용운은 이를 기쁘게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처럼 북연이 갖는 고구려 혈통의 내용과 풍소불 무덤이 위치한 지역이 고조선의 영역이었다는 점을 볼 때, 풍소불 무덤에서 출토된 여러 유물들이 한민족의 문화적 성격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발굴자들도 풍소불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철로 만든 갑편과 말갑옷 조각 및 금동으로 만든 등자(그림 24)의 경우는 그 형태가 중국의 것과 달라 중국의 유물로 편입시키지 못하고 있다.
철로 만든 갑옷 조각은 그 형태에서 긴 장방형과 아래가 둥근 장방형을 주된 양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양식은 고조선과 이를 계승한 여러 나라 갑옷의 고유양식이다.

그림 23. 북표현 서관영자 북연 풍소불 무덤 출토 금제관

그림 24. 풍소물 무덤 출토 금동등자
또한 말갑옷은 한민족이 중국이나 북방지역보다 약 2세기 정도 앞섰기 때문에 이는 고구려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철투구의 경우도 중국이나 북방지역에서는 투구 전체를 주물을 부어 만든 것을 사용했고, 풍소불 무덤에서 출토된 것처럼 장방형의 갑옷조각을 연결하여 만든 철투구는 사용하지 않았다.
등자의 경우도 발굴자들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출토된 등자 가운데 풍소불 무덤에서 출토된 것이 가장 이른 연대의 것이라고 하였는데 중국의 등자 사용연대가 고구려보다 늦기 때문이다. 풍소불 무덤에서 출토된 등자는 고구려 등자의 고유한 양식을 보인다. 그 밖에 은과 동으로 만든 허리띠 역시 끝모습이 나뭇잎모양으로 된 한민족의 고유양식을 나타낸다.
이상의 분석된 내용을 근거로, 북연의 문화는 고구려의 영향을 크게 받았거나 고구려의 것을 수입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금제관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풍소불 무덤에서 출토된 나뭇잎모양의 장식이 달린 금제관식은 고구려의 것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 서술한 요령성 북표현 방신촌에서 출토된 금으로 만든 꽃가지모양의 장식과 유사한 관식이 내몽고자치구 달무기에서 출토되었다. 이 관식이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는 소머리 위에 뿔처럼 뻗어나간 줄기의 끝에 새순 또는 움모양의 나뭇잎이 줄기 끝에 장식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말머리 위에 뿔이 나뭇가지처럼 뻗어나가고 끝에 새순 또는 움모양의 나뭇잎이 장식되어 있다(그림 25, 26).
발굴자들은 이 유물이 북조시대(420~588년)에 속하는 선비족의 것이라고 했다. 이 유물은 북표현 방신촌에서 출토된 관식과 유사한 형식을 하고 있어, 선비족이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받아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위에서 서술했듯이, 한민족이 나뭇잎모양의 장식을 생산하고 사용한 연대는 고조선시대부터이며, 중국이나 북방지역에서는 장식단추나 원형 또는 나뭇잎모양의 장식기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그림 25, 26. 내몽고자치구 달무기 유적 출토 금제관식
따라서 선비족에게 갑자기 출현한 이 같은 관식은 고구려로부터의 영향을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구려의 관식은 나무줄기를 표현했으나 이 달무기의 관식은 소와 사슴의 뿔을 묘사한 모습이며 나뭇잎모양의 장식도 모두 위로 향해 있는 등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선비족의 양식을 보여준다. 선비족은 고구려 초기에는 중국에 의한 호시(互市)나 고구려와 우호적인 관계를 통하여 고구려와 접촉이 비교적 활발했다.
호시의 상황은 『후한서』 「오환선비동이전」에 따르면, 동한 광무제 건무(光武帝 建武) 25(49)년 이후 명제(明帝, 57년) · 장제(章帝, 76년) · 화제(和帝, 89~104년)시기에 오환과 선비족은 장기적으로 영성(寧城)에서 호시를 하였다. 이 영성은 상곡(上谷)에 위치하는데 상곡은 지금의 하북성 선화(宣化) 서북쪽으로 한(漢)시대에 유주(幽州)에 속하는 지역이다.
이를 확인시켜주는 실제 예로 달무기에 근접한 내몽고자치구 화림격이현에 위치한 동한 고분벽화의 ‘영성도(寧城圖)’에 ‘영시중(寧市中)’이라는 방제(榜題)가 보이는데 이는 동한이 영성에 ‘호시’를 설치하고 북방민족들과의 무역과 왕래의 장소로 삼았었음을 의미한다.
고구려는 고조선의 옛 땅을 수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본왕 때부터 미천왕때까지 줄곧 지금의 요서지역에 진출하였는데, 동한 광무제에서 화제에 이르는 시기 유주지역에 여러 차례 진출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는 고구려가 요동태수와 화친을 하여 국경을 정상화시키거나 요동태수에게 패하는 등 동한이 영성에 호시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시기로 호시를 통하여 중국과 선비족 및 고구려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우호적인 경우를 보기로 들면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태조대왕조에 태조왕 69(122)년에 고구려는 선비의 군사 8천여 명을 데리고 중국의 요동지역을 공격하는 등 우호적인 접촉을 갖기도 하였다. 이후 3세기 말 무렵에 이르러 중국의 정권 내부가 혼란한 틈을 타서 중국 동북 지역에 거주하던 선비는 성장을 하게 되며, 줄곧 고구려를 침략하거나 화맹을 맺기도 했다. 이 같은 끊임없는 고구려와 선비의 접촉과 충돌은 선비가 고구려의 우수한 문화를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을 것이다.
따라서 내몽고자치구 달무기에서 출토된 금제관식은 아래 부분은 선비족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으나 윗부분은 고구려의 고유양식인 나뭇잎모양의 장식을 하고 있어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더구나 내몽고자치구 달무기에서 출토된 금제관식과 북연의 풍소불 무덤에서 출토된 금제관식은 모두 연대가 5~6세기에 걸쳐있다.
그런데 고구려의 금제관식인 요령성 북표현 방신촌 출토의 금제관식과 요령성 조양현 십이태향 원태자촌 출토 금제관식 그리고 요령성 조양 전초구 출토의 금제관식은 이보다 약 2~3세기 정도 앞서 출현한 것이므로, 달무기와 풍소불 무덤에서 출토된 금제관식에 시간적으로 충분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령성 출토 금제관식의 국적 재검토에서 서술했듯이 중국학자들은 방신촌 무덤을 처음 발굴했을 당시에는 북연(北燕)의 무덤이라고 하지 않았다. 발굴자들은 이 무덤의 국적을 선비족으로 추측했다. 그러나 이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중국학자들은 이 무덤을 다시 북연의 무덤이라고 명명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시기는 중국이 동북공정을 시작하기 이전 준비과정에 있을 때였다. 중국학자들이 방신촌을 중심하여 북표와 조양 등지의 문화가 고구려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앞의 첫 페이지에서 설명했듯이 그들은 이 지역에 대한 유물 분석에서 고구려적 특징을 간과하지 않았다.
그것은 고고학의 유물특징에서 뿐만 아니라 문헌자료에 존재하는 북연의 종족성격을 소홀히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삼연이 위치하고 있던 지역이 고대 한민족의 거주지역이었던 점도 잘 알고 있다. 삼연(三燕)은 전연(前燕)과 후연(後燕), 북연(北燕)으로 전연과 후연은 선비족이 세운 나라이지만 북연은 고구려 사람이 세운 나라라는 점이다.
북연은 407~436년에 존속했던 고구려 왕족 출신인 고운(高雲)이 후연(後燕)의 왕위를 찬탈하고 세운 나라로 광개토대왕은 사신을 보내 후연 왕 모용운에게 종족의 예를 베풀어 화친을 맺기도 했었다. 따라서 북연문화에는 고조선과 이를 계승한 고구려문화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동북공정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중국학자들은 오늘날 만주가 그들의 영토이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고대부터의 연고권을 주장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 중국은 고대부터 천하는 중국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천하(天下)사상이 그들 정치사상의 근간을 차지해왔다. 따라서 한국고대의 역사도 그러한 정치와 문화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후 중국은 고대부터 다민족국가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어는 민족이나 종족이든 중국 영토 안에 거주한 사람들은 모두 중국의 구성요인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천하(天下)사상의 또 다른 형태인 것이다. 따라서 중국학자들은 역사를 민족 단위가 아닌 영역 중심으로 파악하고 해석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만주역사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어느 민족에 역사가 있었든 현재는 중국의 영토이므로 중국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후 동북공정이 시작되면서 보다 노골화되어 아예 고조선 이전과 고조선 · 고구려 · 발해의 역사는 고대 중국의 동북지방에 속한 지방정권으로 서술되었다. 이것이 중국학자들이 방신촌 무덤을 비롯한 이 지역 유적과 유물들의 국적을 선비족에서 북연으로 수정한 까닭일 것이다.
한국학자들은 이러한 점들은 소홀히 하고 중국학자들이 선비족 무덤이라고 한 내용을 비판과 분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결과 한국 고대 문화의 다양한 내용들이 삼연(三燕)문화 즉 북방문화 또는 선비족의 영향으로 이루어졌다는 관련성으로 무분별하게 연결시켜졌다.
한반도와 만주지역 무덤들에서 출토되어지는 모든 유물들의 통시적인 양식사를 고찰하지 않은 채 중국학자들이 북연 또는 선비족 무덤이라고 한 내용을 비판과 분석 없이 받아들여, 한반도 남부와 만주 집안지역의 한국 고대 문화의 다양한 내용들이 삼연(三燕)문화 즉 북방문화의 영향으로 이루어졌다는 관련성으로 무분별하게 연결시켜졌다.
우리 문화를 보고도 우리문화인 줄 모르고 남의 문화라고 해놓고 거기서 다시 우리 문화의 원형을 찾고 있는 것이다. 왜 우리 민족문화의 원류를 한결같이 밖에서 찾아야 하는지 걱정이다.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첫째는 동천왕이 조양으로 천도한 평양성시기에 요령성의 북표현 방신촌과 원태자촌 및 전초구 출토의 금제관식들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는 방신촌에서 출토된 금으로 만든 관테둘레장식은 앞과 뒤로 금제관식을 꽂아 만든 금관양식이 당시 고구려 고유의 관장식 기법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특히 금제관식에 보이는 달개장식과 불꽃문양은 고조선을 계승한 고구려 관모장식의 특징으로 독창적 양식으로 발전되어 이웃나라에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박선희교수, 고구려 금관의 정치사 고구려 금관이 선비족에 미친 영향
<자료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고구려 금관이 선비족에 미친 영향 (고구려 금관의 정치사, 2013. 11. 29., 박선희)
[이덕일의 한국통사] 고구려 여인은 어떻게 위나라 황후가 됐을까 | 북위를 통치했던 고구려 귀족 일가의 숨겨진 이야기
https://youtu.be/u_dKp_v0XTk?list=PLRAmvpNm4pmknMclNbv8SQ0DcEnzu63dn
'여러나라시대 > 북위(선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북위(선비) (7) 세계문화유산 운강(윈강) 석굴 (9) | 2025.02.19 |
|---|---|
| 북위(선비) (6) 고구려 출신 북위 문소황태후 고조용 묘지명 확인 (32) | 2025.02.18 |
| 북위(선비) (4) 백제-북위 전쟁(488년~490년) (7) | 2025.02.18 |
| 북위(선비) (3) 정복왕조 출현의 전조(前兆): 흉노의 쇠퇴와 만주 선비족의 등장/ 2원통치조직의 창시: 모용선비의 연(燕) 정복왕조(北魏) 출현의 예고/이원통치체제의 유지: 첫 정복왕조 북위(拓跋鮮卑 北魏)의 출현 (8) | 2025.02.15 |
| 북위(선비) (2) 선비족도 고조선의 한 갈래, 고구려와 형제 우의 나눠 (28) | 2025.0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