력사를 찾아서
3. 신석기시대 고고학 (12) 부산 동삼동패총 - 8000년 전~4000년 전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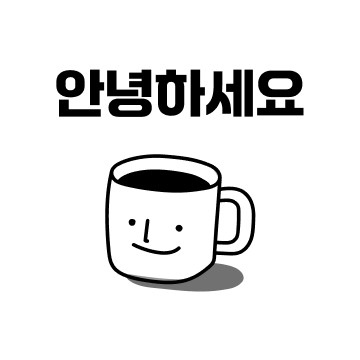
동삼동패총은 남해안지역 신석기문화의 특징과 변천과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이른 시기부터 해양 활동을 통해 일본 규슈지역까지 교류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적입니다. 1929년 일제강점기 동래고등보통학교 교사 오이가와〔及川民次郞〕에 의해 처음 발견된 이후 1963∼1964년 미국 위스콘신대학의 모어(Mohr, A.) 및 샘플(Sample, L.L.)에 의해 시굴조사가 그 후 2015년까지 국립중앙박물관, 부산박물관 등 여러 기관에서 10여 차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신석기시대가 시작되는 약 12,000년 전은 빙하기가 끝나고 후빙기로 접어들면서 구석기시대에 비해 기후가 급속히 따뜻해집니다.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정착 생활을 하고 식물 채집, 사냥, 물고기 잡이를 통해 식량을 확보하였습니다. 동삼동패총에서 출토된 사슴, 멧돼지, 굴, 다랑어, 강치, 고래 등은 신석기시대의 자연환경과 생업활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1)
동삼동 패총에서는 다양한 규격의 팔찌와 각종 장신구가 조개제품이 쏟아져 나왔다. 대량생산 시스템을 갖췄음을 짐작할 수 있다.|동삼동 패총 전시관 제공
■이상한 변호사의 혹등고래
우선 혹등고래는 평균 몸길이가 15m, 체중이 약 30t에 달하는 대형고래이구요. 등 위에 혹 같은 등지느러미가 있고, 위턱과 아래턱에 혹들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혹등고래’라는 이름을 얻었는데요. 그런데 큰 몸집에도 물 위로 힘차게 솟구쳤다가 다시 수면으로 떨어지는 이른바 ‘브리칭(breaching)’으로 유명한 고래 중 하나가 바로 혹등고래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조용한 수면에서 갑자기 물보라를 일으키며 솟구쳐 오르는 혹등고래의 모습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는 이미지를 담고 싶었을 겁니다.
혹등고래는 또 보호본능이 강한 고래로 알려져 있는데요. 2009년에 남극 바다에서 포악한 범고래의 공격으로부터 위기에 처한 빙하 위의 새끼 물범을 배 위에 올려 구조하는 사진이 촬영됐구요. 2017년에는 남태평양 쿡 제도 연안에서 상어의 접근을 감지한 혹등고래가 여성 다이버를 보호하는 영상이 공개되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우영우를 낳고 모른척했던 어머니(태수미·진경 분)가 등장하잖아요. ‘혹등고래’가 이 드라마에서 여러가지 이미지로 활용된 겁니다.
동삼동 패총에서 출토된 혹등고래의 고실골(귀뼈·왼쪽)와 대왕고래의 뼈조각. 출토된 혹등고래의 귀뼈는 길이 93.7mm, 최대폭 86.7mm, 두께 53.4mm에 이른다. 대왕 고래의 뼈조각(오른쪽)은 77.8mm, 두께 63.4mm 정도이다. 혹등고래와 대왕고래는 올해 최고의 화제작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하면서 유명세를 탔다.|동삼동패총전시관 제공
■“혹등고래냐 대왕고래냐”
제가 최근에 부산 동삼동 패총(조개무덤)에서 발굴된 신석기 시대(5000년 전)의 동물 유체를 다룬 보고서(복천박물관의 <동삼동패총 정화지역 동물유체 연구보고서>, 2011)를 보았는데요.
단 50평 정도만 팠는데, 신석기인들이 살았던 자취가 발견되었구요. 특히 갖가지 동물 중 포유류(1만3000여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그중 고래류(2172점), 사슴(1666점), 강치(941점) 등이 주류를 이뤘구요.
이중 제 눈에 들어온 동물은 뭐니뭐니해도 고래류였죠. 특히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의 니시모토 도요히로(西本豊弘) 교수 등의 분석에 따르면 혹등고래와 대왕고래 뼈가 검출되었답니다.
혹등고래는 큰 몸집의 3분의 2까지 물 위로 힘차게 솟구쳤다가 수면으로 떨어지는 ‘브리칭(breaching)’으로 유명한 고래이다.이밖에 가슴지느러미치기, 꼬리지느러미치기 등 다양한 행동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출처:위키백과
어떻게 밝혀냈을까요. 사실 발굴된 고래뼈 대부분이 잘게 부서져 있어서 정확한 종의 분류는 쉽지 않았는데요.
연구팀은 그나마 종의 분류가 가능한 대형 고래류의 고실골(고막 안쪽에 청각기관을 감싸고 있는 일종의 귀뼈) 6점에 주목했는데요. 고래 연구자인 안용락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가해양생명자원 전략센터장에 따르면 이 고실골은 소리를 잘 들리게 하는 일종의 증폭기관이라는군요. 그런데 6개의 고실골 중 완전한 1점은 길이 93.7mm, 최대폭 86.7mm, 두께 53.4mm 정도였는데요.
니시모토 교수가 일본 국립과학박물관에 있는 현생 혹등고래의 ‘고실골’ 표본과 비교해봤는데요. ‘둥그런 것’이 특징인 혹등고래라는 사실을 확인했답니다. 혹등고래 뿐이 아닙니다.
당시 분석팀에 소속되었던 김헌석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전문위원은 “파편만 남은 2점 중 1점의 고래뼈가 77.8mm, 두께 63.4mm 정도였는데, 일부에서 둥근 형태의 홈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대왕고래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극중에서 우영우 변호사가 “대왕고래냐, 혹등고래냐, 그것이 문제로다”라 했던 바로 그 두 고래가 6000년전 유적에서 그대로 나온 겁니다.
■신석기 시대 풍속화와 실증유물
동삼동 패총 유적은 어떨까요. 반구대 암각화가 ‘신석기 시대 풍속화’라면, 동삼동 패총은 그 풍속화를 입증할 ‘실증 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등고래와 대왕고래의 고실골(이석) 등 2172점에 달하는 고래뼈 조각이 그렇습니다.
이 고래뼈 외에도 반구대 암각화가 제시한 신석기인들의 삶을 복원할 고고학 자료들이 차곡차곡 쌓여있었는데요. 패총은 신석기부터 청동기 시대까지 선사인들이 먹고 버린 조개껍데기 무덤이죠. 석회질로 된 조개껍데기는 토양을 알칼리성으로 바꿉니다.
덕분에 패총 안에 들어있는 유물들은 잘 썩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토)기와 석기, 뼈연모, 토제품 등 생활도구는 물론 무덤과 집자리, 화덕시설까지 발견되는 경우가 많죠. 만약 선사인들이 지금처럼 ‘쓰레기 분리수거’를 했다면 어찌되었을까요. 선사시대가 남긴 숱한 삶의 정보를 잃어버렸겠죠.
부산 동삼동 패총에서는 기원전 6000년부터 기원전 1500년까지 신석기 시대 전 기간의 문화층이 켜켜이 쌓여있었다.|복천박물관 제공
동삼동 패총은 1929년 동래고보 교사인 오이가와 다미지로(及川民次郞)가 처음 발견했답니다. 그후 30년이 지난 1962년 미국 위스콘신대 출신인 A. 모아와 L.L 샘플 부부가 발굴을 주도했다가 떠났구요.
1969~71년 국립중앙박물관(서울대와 공동발굴)의 3차례 조사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조기 신석기 시대(기원전 6000년)부터 청동기 시대(기원전 2000~기원전 1000년)가 시작될 때까지 4000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고고학 자료가 나옵니다. 동삼동 패총은 신석기 문화의 전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유적이 된 겁니다.
동삼동 패총에서 출토되는 덧무늬(융기문) 도기들은 유적의 첫 조성연대가 기원전 6000~5000년임을 알려준다. 중국 동북방의 ‘차하이(査海)-싱룽와(興隆窪)’와 제주도 고산리, 강원 고성 문암리 출토 덧무늬 도기 등과 같은 시기임이 판명되었다.
■동삼동에서 출토된 곰 인형
찬찬히 뜯어볼까요. 이곳에서 숱하게 출토된 덧무늬(융기문) 도기들은 유적 조성연대가 기원전 6000년임을 알려줍니다.
중국 동북방의 ‘차하이(査海)-싱룽와(興隆窪) 유적’과 울산 세죽유적, 강원 고성 문암리 출토 덧띠무늬 도기와 같은 시기임이 판명된겁니다. 중국 동북방부터 한반도 남부까지가 기원전 6000년 전부터 같은 문화권임을 알 수 있는 증좌가 나온거죠.
또 다양한 문양의 빗살무늬 도기류가 쏟아졌는데요. 신석기인들이 토기에 이렇듯 갖가지 문양을 새기면서 예술적 감각을 발휘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유물 중에는 크기가 12.9㎝, 11.8㎝ 정도인 조개 가면이 있는데요. 가리비에 사람의 눈과 입 모양으로 구멍을 뚫은 형상입니다.
동삼동 출토 곰(熊) 모양의 흙인형. 이 유물은 기원전 4500~기원전 3500년 문화층에서 확인됐다. 동시기 중국 훙산문화(紅山文化·기원전 4500~기원전 3000년) 유적지인 중국 뉴허량(牛河梁)의 여신전에서 발굴된 곰이빨, 흙으로 만든 곰 소조상 등과 흡사하다. |동삼동패총전시관 제공
곰(熊) 모양의 흙인형도 의미심장합니다. 이 유물은 기원전 4500~기원전 3500년 문화층에서 확인됐는데요.
이것은 동시기 중국 훙산문화(紅山文化·기원전 4500~기원전 3000년) 유적지인 중국 뉴허량(牛河梁) 유적에서 발굴된 곰이빨과 흙으로 만든 곰 소조상 및 옥기 등과 흡사합니다. 곰을 숭상했던 단군 조선이 연상됩니다.
또하나, 2003년 유물 정리 과정에서 극적으로 찾아낸 사슴 그림이 있죠. 뼈나 대칼 같은 도구로 그렸는데요. 세밀한 형상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그 특징만 잡아 묘사함으로써 대상물의 이미지를 간결하고 단순하게 형상화했습니다. 신석기인이 이토록 첨단의 미술기법을 발휘하다니요. 발굴자들이 놀란 유물이 또 있었습니다.
2003년 유물 정리 과정에서 극적으로 찾아낸 사슴 그림(왼쪽 사진과 그림). 디테일한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그 특징만 잡아 묘사함으로써 대상물의 이미지를 간결하고 단순하게 형상화했다. 오른쪽 사진은 동삼동에서 출토된 조개가면. 사람의 눈과 입 모양으로 구멍을 뚫었다.|동삼동패총전시관 제공
■신석기 시대 명품 팔찌 공장
혹등고래와 대왕고래뼈가 확인된 1999년 조사에서 1500여 점에 이르는 조개팔찌(패천·貝釧)가 쏟아져나왔다는 겁니다.
이들 조개팔찌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완제품은 물론 파손된 제품과 아직 제작되지 않은 제품 등이 섞여 있었습니다.
출토 팔찌의 70~80%는 중간단계에서 파손됐고, 일부는 마연 및 마무리 단계에서 깨졌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조개팔찌의 생산공정을 웅변해주고 있죠. 동삼동에는 대규모 ‘팔찌공장’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또 이 팔찌의 재료가 투박조개(90%)라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투박조개는 수심 5~20m 사이의 모래밭에서 서식하는데요.
바위가 많은 일본 쓰시마(對馬島)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당시 하인수 복천박물관 보존연구실장은 실증적인 연구 끝에 ‘동삼동 조개팔찌=광안리산 투박조개’일 가능성을 개진했습니다. 투박조개는 매끌매끌하고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데요.
투박조개는 매끌매끌하고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다. 그만큼 가공하기도 어렵다. 투박조개 팔찌가 최고급 명품 장신구였다는 것이다. 동삼동에서 출토된 일본산 흑요석은 한국산 명품 팔찌의 수입대금으로 지불한 현물일 가능성이 크다.|동삼동 패총전시관 제공
그만큼 가공하기도 어렵죠. 조개팔찌를 만드는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기술자였던 셈입니다. 출토된 유물에서 보듯 실패율이 높았어도 투박조개만 고집한 이유가 있었죠. 투박조개 팔찌가 최고급 명품 장신구였다는 겁니다.
또 일본 규슈(九州) 사가(佐賀) 패총에서 출토된 조개팔찌 113점 가운데 투박조개 팔찌가 84%(95점)나 되는데요.
일본에서는 출토되지 않는 투박조개 팔찌가 규슈에서 나온 이유가 있죠. ‘동삼동산 조개팔찌’가 일본으로 대량 수출됐다는 이야기죠. 반복하자면 동삼동은 당대 수출용 명품 팔찌를 제작한 ‘산업단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으로부터 8000년전부터 4000년전까지 신석기인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역동적인 삶을 살았죠.
바다에서는 혹등고래와 대왕고래 등 각종 고래들을 관찰·사냥했고, 또 육지의 첨단 수출단지에서 대량 생산한 최고급 명품 팔찌를 수출하면서 말입니다.(이 기사는 안용락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가해양생면전략센터장, 김헌석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전문위원, 하인수 전 복천박물관장, 임수진 동삼동패총전시관 학예사, 전호태 울산대 교수 등이 도움말과 자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기자. 암각화에 새긴 ‘신석기시대 풍속화’…4000년의 삶이 조개무덤에 켜켜이[이기환의 Hi-story].2022. 12. 5. (2)
신석기시대에 국제적으로 유행한 귀걸이가 있었다. 그 주인공은 결상이식(玦狀耳飾)이라고 불리는 유물로, 한쪽이 트인 고리 모양 옥 귀걸이다.
1999년 부산 동삼동패총에서는 우리나라 두 번째로 결상이식이 출토되어 신석기시대 옥 귀걸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절반 정도가 부러진 상태지만, 독특하게 석영으로 만들어지고 가공 흔적이 잘 남아있어 연구자료로 가치가 높다.
신석기시대 옥 귀걸이…집단 내 소수의 사람들만 착장

결상이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연해주, 일본 등에서도 발견되어 동아시아 차원에서 사랑받은 장신구였다. 9000~8000년 전쯤 중국 내몽고 지역 또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계인 우수리강 유역에서 탄생하여 주변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가장 외곽지역인 일본에서 2000점 넘게 출토되는 특이한 현상도 엿보인다.
한반도에서 결상이식은 현재까지 모두 12점이 출토되었으며, 편평한 바닥 토기가 쓰인 7500~6000년 전 무렵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다. 고성 문암리, 청도 사촌리, 울주 신암리·처용리, 부산 동삼동, 사천 선진리, 여수 안도, 제주 고산리·도두동·삼양동·용담동 등 중동부~남부지역에서 발견되었다.
재료로는 연옥·옥수·석영·납석 등이 사용되었고, 가운데 구멍은 드릴과 활비비를 이용한 천공(穿孔)기법으로, 귓불에 끼우는 결구(玦口) 부분은 돌과 모래가루를 이용한 찰절(擦切) 기법으로 정교하게 제작됐다.
제주 고산리 유적 출토 결상이식은 실을 사용하여 결구를 만들었는데, 이는 중국과 러시아 연해주의 결구 제작기법과 동일한 기술이다. 연구자들은 중국·러시아 연해주와 가장 멀리 떨어진 제주도에서 같은 제작기법이 확인된 명확한 이유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결상이식이 제대로 출토되는 경우는 대부분 무덤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무덤 유적에서는 대롱옥·구슬옥·펜던트 등의 장신구와 함께 출토됐으며, 우리나라 고성 문암리와 울산 처용리에서는 의례용으로 추정되는 곱게 마연한 돌도끼와 같이 부장돼 있었다. 무덤에서 놓인 위치가 대부분 인골 머리 부분이어서 귀걸이였다고 추정한다.
출토 양상을 통해 판단컨대, 신석기시대에 결상이식이 매우 귀하게 여겨졌던 것은 틀림없다. 희소한 재료 확보와 가공이 그리 간단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사회적으로 정해진 엄격한 규율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집단 내에서 특정 역할을 맡은 소수 사람이 썼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은 결상이식을 착장하기 위해 귓불을 뚫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7000년 전 무렵 신석기시대 동아시아에는 서로 다른 많은 집단이 할거했지만, 공통으로 결상이식이 어떤 신비한 힘을 가졌다고 믿었던 것 같다. 신체 변형 고통을 이겨낸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었던 귀걸이의 수수께끼를 풀어낸다면, 신석기시대 문화를 밝히는 데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터이다.
국제신문. 김은영 부산박물관 조사연구팀장. [수장고에서 찾아낸 유물이야기] <122> 신비의 귀걸이, 결상이식 2024. 10. 28. (3)

<자료출처>
(1) 동삼동패총전시관, https://museum.busan.go.kr/dongsam/index
(2) https://v.daum.net/v/20221205060022841 경향신문. 2022. 12. 5.
(3) https://v.daum.net/v/20241028195212549 국제신문. 2024. 10. 28.
<참고자료>
동삼동 패총(東三洞 貝塚)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aks.ac.kr)
https://v.daum.net/v/20221208070707291
[고고학자 조유전과 떠나는 한국사 여행](18) 부산 영도 동삼동패총 유적 上 - 경향신문 (khan.co.kr)
[고고학자 조유전과 떠나는 한국사 여행](19) 부산 영도 동삼동패총 유적 下 - 경향신문 (khan.co.kr)
‘반구대 암각화’ 미스터리 푼 열쇠, 5천년 전 토기에 새겨져 있었다|동아일보 (donga.com)
동삼동 패총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진 - 부산일보 (busan.com) 2012-12-19
부산 복천박물관, '고대인의 멋 귀걸이' 특별전 연다 - 부산제일경제 (busaneconomy.com)
신석기시대편 - 문화유산 지식e음 (nrich.go.kr)중서부지역의 신석기취락
신석기시대편 - 문화유산 지식e음 (nrich.go.kr)동해안지역의 신석기문화
신석기시대편 - 문화유산 지식e음 (nrich.go.kr)남해안지역의 신석기문화
의주 미송리 유적(義州 美松里 遺蹟)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aks.ac.kr)
서포항 유적(西浦項 遺蹟)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aks.ac.kr)
신석기시대편 - 문화유산 지식e음 (nrich.go.kr)궁산문화
용강 궁산리 유적(龍岡 弓山里 遺蹟)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aks.ac.kr)
평양 남경 유적(平壤 南京 遺蹟)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aks.ac.kr)
신석기시대편 - 문화유산 지식e음 (nrich.go.kr)세죽유적
신석기시대편 - 문화유산 지식e음 (nrich.go.kr)신암리유적
연대도유적 - 신석기시대편 - 문화유산 지식e음 (nrich.go.kr)
범방동 패총(凡方洞 貝塚)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aks.ac.kr)
'환국시대 > 환국' 카테고리의 다른 글
| 3. 신석기시대 고고학 (14) 여수 안도패총 - 8000년 전~4500년 전 (11) | 2025.01.19 |
|---|---|
| 3. 신석기시대 고고학 (13) 부산 가덕도 장항유적 - 7200년 전~6400년 전 (10) | 2025.01.19 |
| 3. 신석기시대 고고학 (11) 울산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 7000년전 (14) | 2025.01.18 |
| 3. 신석기시대 고고학 (10) 창녕 비봉리 패총 - 8000년 전~청동기시대 (17) | 2025.01.17 |
| 3. 신석기시대 고고학 (9) 양양 오산리유적 - 8000년 전~3500년 전 (33) | 2025.01.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