력사를 찾아서
우리겨레 력사학자, 력사서 (21) 고대사 중심무대를 한반도로 축소한 김부식과 중화사관 도입/ 유교사학은 한국 고대사의 왜곡에서 출발/ 유교사학에서도 가장 퇴행적인 남인 실학자들의 고대사 인식 본문
우리겨레 력사학자, 력사서 (21) 고대사 중심무대를 한반도로 축소한 김부식과 중화사관 도입/ 유교사학은 한국 고대사의 왜곡에서 출발/ 유교사학에서도 가장 퇴행적인 남인 실학자들의 고대사 인식
대야발 2025. 4. 3. 18:07

유교사학이 중화사관이라는 틀 속에 우리 역사를 최초로 집어넣은 사건은, 신채호가 "조선역사상 일천년 이래 제일 대사건"이라고 표현했던 고려중기 서경천도운동(1135)과 그 실패 과정에서 드러난 선도(仙道:선불습합) 세력과 유교 세력의 대충돌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이루어졌다. 승리하여 정치권력을 장악한 유교 세력은 문신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정치 표방을 합리화하고 유교사관 확립을 도모하였다. 한국사를 유교사관으로 해석한 삼국사기를 편찬하면서 배달국과 단군조선을 역사기록에서 배제하고 신라를 중심으로 삼국사를 서술함으로써 한민족의 역사인식을 송두리째 바꾸고자 하였다.
■ [기고] 선도 홍익사관의 전승 과정 연구(4) 고대사 중심무대를 한반도로 축소한 김부식과 중화사관 도입
K스피릿 입력 2022.05.16 10:37 업데이트 2022.05.16 15:19
기자명 소대봉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
유교사학은 지나간 사건의 선악과 시비(是非)를 포폄(褒貶)하여 현재의 교훈을 삼으려는데 목적을 두고 역사서술을 하였다. 따라서 그것은 일종의 교훈(敎訓)사학이며, 그런 점에서 이데올로기적이다. 포폄의 가치기준은 왕도사상과 강상(綱常)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유교경전이다. 강상은 유교의 기본 덕목인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을 말한다. 삼강은 군위신강(君爲臣綱)・부위자강(父爲子綱)・부위부강(夫爲婦綱)이다. 오상은 사람이 항상 행(行)하여야 하는 5가지 바른 행실, 곧 인・의・예・지・신(仁・儀・禮・智・信)이다.
유학자들은 중화주의라는 유교적 세계관과 가치 기준에서 벗어나는 고대 역사경험은 황탄불경(荒誕不經)하다고 배척하였다. 공자가 편찬한 《상서(尙書)》에서는 중국 역사가 요순에서 시작된다. 신시배달국은 중국의 요순보다 1500년 앞선 시기에서 시작하는 역사이니, 유교사서에서 신시배달국 기록을 삭제한 것은 중화주의 유학자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유교문화와 중국식 예론(禮論)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던 시기에 관해서까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사대・모화적인 성리학적 가치관으로 재단하여 서술하였다. 선도사서인 고기류에 기록된 ‘고대의 역사경험’을 삭제하고 기록하지 않는 중화주의 유교사서 서술의 기본방향은 당연히 상고・고대사에 대한 왜곡으로 귀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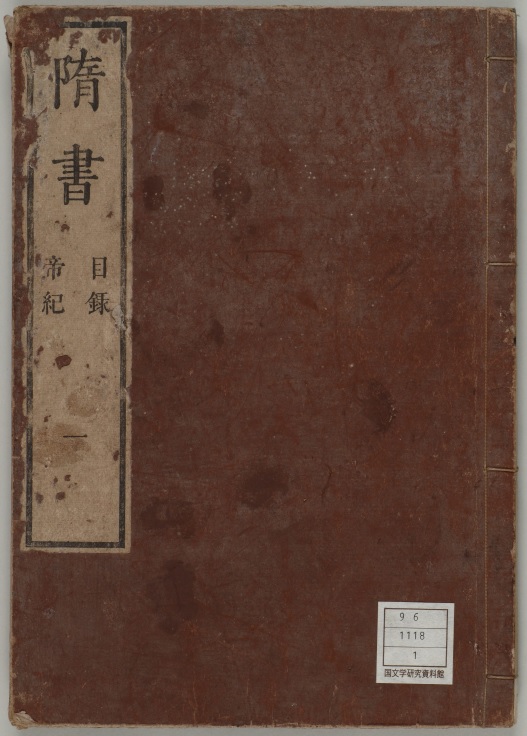
수서. [사진 출처=Japan search]
유교사학이 중화사관이라는 틀 속에 우리 역사를 최초로 집어넣은 사건은, 신채호가 "조선역사상 일천년 이래 제일 대사건"이라고 표현했던 고려중기 서경천도운동(1135)과 그 실패 과정에서 드러난 선도(仙道:선불습합) 세력과 유교 세력의 대충돌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이루어졌다. 승리하여 정치권력을 장악한 유교 세력은 문신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정치 표방을 합리화하고 유교사관 확립을 도모하였다. 한국사를 유교사관으로 해석한 삼국사기를 편찬하면서 배달국과 단군조선을 역사기록에서 배제하고 신라를 중심으로 삼국사를 서술함으로써 한민족의 역사인식을 송두리째 바꾸고자 하였다. 유교사관으로 역사를 다시 쓴다는 것은 유교세력이 장악한 정치권력을 항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였다. 조선을 강제로 병합한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사관으로 조선 역사를 다시 쓴 것도 같은 논리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유교문화 입장에 입각하여 고대 사서를 편찬하면서 유교사관에 배치되는 고대문화 요소를 전부 삭제하고 단군조선사조차도 취급하지 않았다.
북벌을 하여 옛 강토를 회복하자고 주창한 서경천도세력의 입론(立論)을 없애 사대의 대척점에 선 자주・독립 역사인식의 싹을 제거하려 하였던 유교 세력에게 한국고대사 중심무대였던 고대 평양이 만주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김부식은 한국고대사 중심 무대였던 고대 평양을 최초로 오직 패수(浿水)라는 이름에만 근거하여, 한반도 평양으로 비정하였다. 김부식은 한나라 낙랑군이었던 평양성 남쪽에 있었다고 기록된 《신당서(新唐書)》 패수(浿水)와 《수서(隋書)》 ‘수양제 고구려원정 조서’에 등장하는 패강(浿江)이 신라 서북에 있던 패강(浿江=대동강)과 같은 것이라고 자의적(恣意的)으로 단정하고, 따라서 대동강(大同江=浿江) 북쪽에 있는 지금의 평양을 한사군 낙랑군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김부식이 인용한 《수서》 구절 바로 앞에는 수양제 113만 대군의 24도(道:공격로)가 명시되어 있다. 수나라 대군은 한나라 낙랑군에 속하는 현이었던 ʻ조선, 함자, 점제, 대방, 해명, 장잠, 누방, 제해, 혼미, 동이ʽ도를 포함, 24개 공격로를 통해 평양으로 집결하라고 조서에 나와 있는 것이다. 낙랑군을 지나고 나서 평양으로 집결하라는 것이므로 그 평양이 이미 지나온 낙랑군일 수는 없으며, 당연히 한반도 평양이 그 낙랑군일 수도 없었다. 수양제의 조서는 낙랑군이 요서나 요동지역에 있었기에 가능한 명령이었다.
《수서》 ‘수양제 고구려원정 조서’에는 수양제의 1차 침략 당시인 영양왕 23년(612)에 고구려는 이미 사기 화식열전에서 연나라 강역으로 기록된 발해와 갈석산이 있던 요서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2년 후인 대업 10년(614년) 3차 고구려정벌에서 내린 조서에서도 “지난해 군대를 출동시켜 요수와 갈석산에 가서 죄를 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수서》와 《구당서》 「배구열전」에는 한군현은 고죽국이 있었던 곳에 설치되었고, 고죽국 지역은 수나라 시기에는 고구려 영토에 속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고죽국의 위치를 요서지역 난하 하류에 비정하고 있다. 《주서》에서도 고구려 서쪽 강역이 요수를 건너고 동서가 2000리(里)라고 하였다.
나머지 14개의 공격로도 요동, 현도, 부여, 후성, 양평, 갈석 등 대부분 요서나 요동에 있는 지명들이다. 24도 중에는 임둔도(臨屯道: 右 제4軍)와 동이도(東暆道: 右 제10軍)가 보인다. 임둔과 동이는 요동이나 요서에 있되 같은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동국통감》 이래 많은 조선 유학자들은 한사군의 하나인 임둔군의 치소가 동이현인데 지금의 강릉이라고 보아 왔다. 김부식이 인용한 《수서》의 ʻ수양제 고구려원정 조서ʼ 기록은 조선 유학자들의 한사군 지리비정 오류를 바로잡는 중요한 사료이다.
강역(疆域)에 대한 기록은, 상대 국가에게 유리하게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경계를 접한 국가들의 사료가 제일 신빙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다른 기록도 아닌 국가의 운명을 걸고 고구려와 전면전을 벌인 수나라 황제 양광의 조서이므로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글을 잘 짓고 고금을 잘 알아 학사들이 믿고 따르니 능히 그보다 위에 설 사람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김부식이지만 중화주의 유교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자신의 신념에 부합(符合)하는 사료만 인용하여, 고대 요동지역에 있었던 낙랑군을 지금의 평양에 있었다고 자의적으로 주장하였다. 한국고대사 중심무대를 한반도로 국한시키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는, 중화사관이라는 기준으로 한민족 상고・고대문화를 인식하고 서술하면서 선도사서에 기록된 배달국, 제천행사, 단군왕검의 치적, 홍익실천 기록들이 유교사서 기록에서 삭제되었다. 기왕에 편찬되었던 선도사서들은 불태워지거나 수거되는 수난을 겪었다. 고려의 입국이념(불교와 습합된 선도)에 입각하여 예종 원년(1106) 왕명으로 편찬되었던 해동비록은 그 이후 기록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성리학을 국시로 하는 유교국가 조선에서 선도사서들은 민간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없었고 보관을 하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세조~성종까지 3대에 걸쳐 관청・민가・사찰에 있는 선도 관련 서책들은 ‘사처(私處)에 보관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 하여 모두 수거 대상이 되었다. 조정에서는 자진하여 바치면 포상을 하거나 품계를 높여주고, 책을 숨긴 사실을 고발해도 포상을 하면서 수거를 독려하였고, 숨기다가 들킨 자는 참형에 처했다. 유교의 나라에서 선도사서들은 바위에 구멍을 파고 보관하여 겨우 후세에 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선도사학은 조선사회에서 저류(底流)화되어 겨우 명맥을 유지하였고, 유교사학이 고착화될수록 선도사학은 저류화되었다.
성리학을 국시(國是)로 조선을 개창한 신진사대부 세력들은 지배체제 정당화와 통치 이념 수립에 목표를 두고 사서(史書)를 편찬하였다. 15세기에는 중화주의 유교사관에 입각하여 한국사가 체계화되었다. 관찬사서 《동국통감》(1485)이 대표적이다. 중화주의 유교사관을 더욱 강렬하게 주장하던 15세기 《동국통감》은 사대적이라고 비판받는 《삼국사기》보다 더 철저하게 사대주의 중화사관에 입각하여 편찬된 사서였다.
조선은 내정과 외교를 모두 자주적으로 하고 명나라의 통제를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선’이라는 국호를 선정하는 경위에서 보이듯이 중국 왕(주무왕(周武王))의 봉함을 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국가이며, 조선의 정치와 교화와 풍속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이유를 들어 기자조선 후계자임을 천명하였다. ‘신라, 백제, 고구려 등이 중국의 명을 받지 않고 스스로 명호를 받은 것에서 무슨 취할 게 있겠느냐’는 조선 창건 주도세력, 정도전의 시각을 염두에 둔다면 유교 건국세력의 사대(事大)는 외교의 일환이라기보다는 건국이념으로 보인다. 더욱이 세종이 태종의 무덤 개석(蓋石)에 새긴 ‘명나라의 제후국인 조선국(有明朝鮮國)’이라는 문구를 보면, 사대를 정체성으로 한 조선이 선명하게 읽힌다.
그러나 창업(創業)의 최초 원인이 사대주의를 표방한 위화도 회군으로 북벌론자 최영을 죽이고 고려 왕통을 빼앗아 창업하였으므로 조선 건국의 정통성은 사대주의가 담보하게 되었다. 중화・사대를 기본으로 하는 유교적 역사인식, 즉 중화사관으로 우리 역사(國史)를 보니 중국문화를 이 땅에 전수한 것으로 전해지는 기자가 주목되었다. 기자는 단순히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그를 통해 비로소 소중화(小中華)로 편입되고 나아가 그를 통해 중화를 더욱 사대하게 만드는 매개체였다. 기자가 주목되자 사대관계가 존중되었으며, 사대관계가 형성된 이후의 강역을 실지(失地:만주)보다 더 중시하는 ‘새로운’ 국사 인식이 성립되었다.
15세기 관찬사서 내용이 방대하고 상세하여 사람들에게 읽히기 어려운 점이 있어 16세기에는 읽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략형(史略型) 역사 편찬이 개인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때는 새로운 연구가 진척된 것은 없고 오직 사료의 취사선택과 편찬체제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을 뿐이다.
16세기에는 사적소유에 바탕을 둔 지주제가 발달하면서 지배층의 국가권력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현저히 약화되기 시작했다. 지주ㆍ전호제를 배경으로 성장한 사림은 절의(節義)라는 가치를 내세워 훈구파에 맞섰는데 그 절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학풍의 도학(주자학) 공부가 요구되었다. 사림의 도학숭상은 그 도학 발상지인 중국사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었다. 사림에게 국사는 고유한 혈통과 고유한 문화를 가진 문화공동체로서의 민족 역사라기보다도 중국에서 발원한 도학이 동국(東國)에서 전개된 역사인 것이었다. 즉, 사림은 한국사와 중국사를 개별 민족 역사가 아닌 똑같은 유교문화권 속에서의 소중화와 대중화로서 인식하였다. 대중화와 소중화는 단지 지리적 차이와 군신적 사대관계의 차이일 뿐이었다.
사림에 의해 성리학적 보편주의가 확대되고, 기자가 본격적으로 탐구되면서 기자를 통한 중화주의가 확대되었다. 존화(尊華) 사대의식은 강화되었고 중국 문명을 전파하여 동국(東國)을 소중화로 만들었다는 기자에 대한 존숭 또한 강화되었다.(1)
유교사학은 기본적으로 선도사학의 상고・고대사를 왜곡하였다. 중화주의 유교사관에서 수용할 수 없는 배달국, 민족 고유의 사유체계와 제천에 대한 기록은 삭제하였다. 우리 역사 시작을 환웅이 아닌 단군으로 보았고, 단군조선의 문화수준은 낮았다고 평가하였다. 정통 계승은 선도사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기자를 중심에 놓았고, 낙랑군 조선현 위치를 지금의 평양으로 보아 역사 강역을 축소하였다.
[기고] 선도 홍익사관의 전승 과정 연구(5) 유교사학은 한국 고대사의 왜곡에서 출발
K스피릿 입력 2022.05.23 10:35 업데이트 2022.05.23 10:37
기자명 소대봉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
앞서 2부에서 선도사학에서 바라보는 상고・고대사를 한민족 고유의 사유체계와 제천의례, 한민족 역사의 시작, 단군조선의 문화수준, 역사 정통의 계승, 위만조선 도읍지에 세워졌다는 낙랑군 조선현 위치라는 다섯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선도사학은 중화주의 유교사학에 의해 왜곡되어 전승되었는데 왜곡의 기본 방향 역시 다섯 가지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한민족 고유의 사유체계와 제천의례에 대한 인식이다. 존재의 본질을 밝음・생명(氣)・양심으로 인식하고, 밝음을 온전히 갖춘 사람이 수행을 통해 내면의 밝음을 우주의 밝음과 일치시키고 이상적인 공동체를 현실에서 구현(홍익인간・이화세계)한다는 선도사학의 홍익사관은 유교사학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중국을 내(內:華)로 이적(夷狄)을 외(外)로 인식하고 이내제외(以內制外:안이 밖을 제압한다)의 화이론에서 출발하는 중화사관은 분리와 대립, 지배・통제가 사유와 실천의 대전제이므로 조화・상생의 홍익사관과는 사유체계가 달랐기 때문이다.
유교적 세계관에서는 하늘과 땅의 소통은 천자의 독점적인 권한이다. 하늘과 땅의 연결을 끊어 하늘과 인간의 연결을 천자 1인이 독점하는 사유체계에서 국가・사회적인 제천행사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조선시대 유교사서에서 선도적 사유체계와 제천의례가 기록될 수 없었던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이는 선도사서를 참고하여 『동국역대총목』(1705)을 쓴 조선후기 홍만종이 『삼국유사』를 인용하면서도 한국선도 사유체계의 궁극적 목적인 홍익인간・재세이화는 인용하지 않았던 것에서 확인된다. 이종휘가 『동사(東史)』(1803)에서 선도사서를 인용했음을 밝혔으나, 유교에서 제천은 천자만의 권한이었기에 제천행사를 귀신숭배로 이해하고 서술하였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둘째, 한민족 역사의 시작에 대한 인식이다. 선도사학에서는 우리 역사의 시작은 환웅천왕의 배달국에서 비롯한다고 보았다. 조선전기 유교사학에서는 신인이 단목 아래 내려왔는데 국인들이 왕으로 삼았다(“有神人降于檀木下 國人立爲君”, 東國通鑑)고 기록하여, 환웅과 단군을 하나로 합쳐 단군조선이 건국되었다고 하였다. 신단수 아래 내려 온 신인이 환웅이 아닌 단군으로 기록되면서 역년이 1565년에 달하는 배달국 역사는 삭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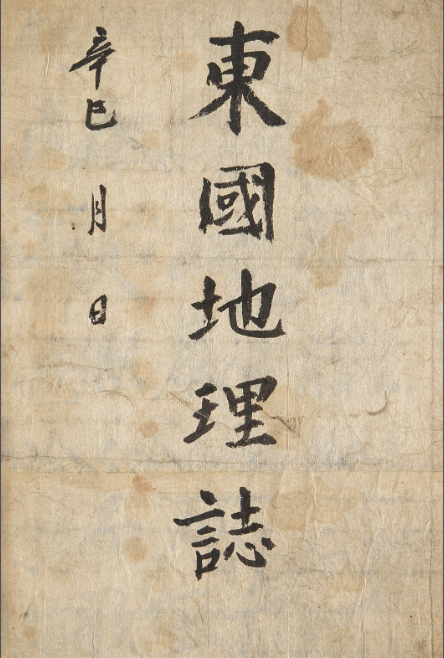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표지. [사진출처 규장각]
조선시대 유교사학에서는 역사와 혈통의 시작은 대체로 단군에서 비롯한다고 인식하였다. 단군조선 대신에 기자조선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해석하여 단군조선의 정통성을 부정하였던 홍여하의 『동국통감제강(東國通鑑提綱)』(1672)에서도 우리 역사의 시작은 단군에서 비롯된다고 인식하였다.
셋째, 단군조선의 문화수준에 대한 인식이다. 선도사학에서는 유학자들이 기자 시기의 치적으로 삼는 문화 교화가 단군조선 시기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조선전기 유교사학에서는 기자 시대에 중국 문화가 전파된 후 조선이 문명국이 된 것으로 바라보았다. 단군조선 문화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본 것이다. 선도사서 『고기(古記)』를 인용하여 선도적 역사인식의 영향을 받은 것이 확인되는 권람도 같은 인식이었다. 조선후기에도 단군조선의 문화수준은 대체로 조선전기와 같이 저열하다고 보았다.
넷째, 역사 정통의 계승에 관한 인식이다. 선도사학에서 ‘배달국단군조선부여열국(列國)’으로 정통이 계승되었다고 보는 것과는 달리, 조선전기 유교사학에서는 역사 정통은 ‘단군기자위만사군이부삼한삼국’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단군은 혈통의 시작일 뿐 정치와 문화는 기자시대에서야 발전했다고 인식하였다.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사관으로 우리 역사를 보니 주(周)나라에 홍범구주(洪範九疇)를 가르쳐준 현인이자 중화 문화를 이 땅에 전수하여 동방을 소중화로 만들어 주었다는 기자가 가장 중시되었다.
17세기에 정통론이 등장한 이후 조선후기 유교사학에서는 정통을 찬탈하였다는 ‘위만한사군’이 빠지면서 역사 정통은 ‘(단군)기자마한신라’로 승계된다고 보았다. 영남 남인의 역사인식을 반영하는 홍여하의 동국통감제강은 기자를 정통의 첫머리로 삼았다는 면에서 역사 정통은 단군에서 비롯된다는 기왕의 인식과는 아주 달랐다. 주자학 명분론에 충실한 입장에서 동국통감을 주자강목법에 맞추어 개찬한 동국통감제강에서 홍여하는 단군조선 대신에 기자조선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해석하여 단군조선의 정통성을 부정하였다.
홍여하는 중국인 기자로부터 그 후손인 기준왕(箕準王)의 마한을 거쳐 기자의 정통을 잇는 신라로 이어진다는 새로운 정통관계를 수립하여 우리 역사의 체계를 바꾸고자 하였다. 1644년 중국 대륙 주인공이 오랑캐로 여겨졌던 청나라로 바뀌면서 천하에는 오직 소중화만이 남게 되었다고 보는 인식에서는 중화문명 전수자요 중화의 합법적 수봉(受封)군주인 기자에 대한 숭상이 강화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다. 한영우는 홍여하의 역사서술을 “국사의 위치는 이(夷)가 아니라 화(華)로서 정립된다”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실상 한(韓)민족 역사를 중화 정신 즉, 중국인의 정신으로 새로이 쓴 것을 말하는 것이다.
주자학 명분론에 충실한 중화사관에 입각하여 단군 정통을 부정하자 우리 역사는 중국인 기자로부터 시작하는 역사로 변질되었다. 물론, 공자가 중화문명 정수로 인정한 주(周)나라에 홍범구주를 가르친 현인(賢人)이자 중화의 선진문물을 전파하여 동방(東方)을 소중화로 탈바꿈시킨 교화(敎化)군주라는 관점에서의 역사서술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단군 정통이 부정된 상태에서 초점이 ‘중국인’ 기자에 맞추어지자 우리 역사 출발점은 중국인 기자로부터 시작되는 역사, 중국 식민지로부터 시작된 역사로 변개되었다. 중화사관에 철저히 물든 조선후기 유학자의 붓끝에서 시작된 단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익・안정복・정약용・한치윤・한진서 등 남인 실학자들에게 이어지면서 후일 식민사학과 동북공정이라는 거대한 담론에 악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위만조선 도읍지에 세워졌다는 낙랑군 조선현 위치에 대한 인식이다. 선도사학에 의하면 기준왕은 고대 요동에 있던 번조선 왕이었다. 위만의 왕검성은 번조선 기준왕의 도읍에 세워졌다. 위만정권이 내부 반란으로 무너지고 서한에게 항복한 후 세워진 낙랑군 위치는 당연히 번조선 지역에 있었다.
조선전기 유교사학은 단군, 기자, 위만의 도읍을 모두 한반도 평양 일대로 보았다. 따라서 고대사 중심무대는 한반도로 축소되었다.
실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한백겸은 『동국지리지(東國地理志)』(1614)에서 최초로 지리비정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그는 낙랑군에서 발원하는 열수(列水)가 요동에 있다는 중국 문헌을 인용(“郭璞云 山海經曰 列 水名 在遼東”, 東國地理志)하면서도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낙랑군이 한반도 평양에 있다고 모순되게 주장하였다. 무리한 추정이나 단정에 근거하거나 지명 한 글자가 같으면 억지로 끌어 붙여 유리하게 해석하는 독특한 고증방법을 통해 한서지리지 낙랑군 속현들을 한반도 안으로 비정하기도 하였다. 영조 때 학자 신경준은 수성(遂城)은 요동지역에 있었는데 한백겸이 수안(遂安)의 수자(遂字)에 억지로 끌어 붙였다고 비판하였다.
한백겸은 삼한을 북쪽 조선과 대등한 정치세력으로 보는 남북이원적 국사체계를 세웠다는 평과 동시에 단군조선을 한강 이북으로 한정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남북이원적 고대사 인식은 정약용과 식민사학을 집대성한 조선총독부 교과서(심상소학일본역사 보충교재 교수참고서1)를 거쳐 2015 교육과정 중학 역사교과서와 고등 한국사교과서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고조선 표지유물인 비파형동검이 한강 이남은 물론 제주도에서도 출토되었다고 지도에는 표시하지만, ‘고조선 문화범위’는 한강 이북으로 제한하는 기이한 역사인식의 출발점이었다.
조선후기에도 많은 학자들은 고대사 중심무대였던 고대 평양(한사군 낙랑군)은 지금의 평양에 있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선도사서를 참고한 허목의 『동사(東事)』, 홍만종의 『동국역대총목(東國歷代總目)』, 이종휘의 『동사(東史)』도 여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이익은 관구검이 현도군에서 출병하여 낙랑군으로 퇴각하였다는 사료를 들어 낙랑과 현도는 요동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낙랑군 치소(治所)는 요동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관할지역이 평양까지였다고 보는 점에서는 ‘재평양설’과 ‘재요동설’을 절충한 것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교사학은 기본적으로 선도사학의 상고・고대사를 왜곡하였다. 중화주의 유교사관에서 수용할 수 없는 배달국, 민족 고유의 사유체계와 제천에 대한 기록은 삭제하였다. 우리 역사 시작을 환웅이 아닌 단군으로 보았고, 단군조선의 문화수준은 낮았다고 평가하였다. 정통 계승은 선도사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기자를 중심에 놓았고, 낙랑군 조선현 위치를 지금의 평양으로 보아 역사 강역을 축소하였다.
* 선도사학의 영향과 한계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유교사관과 유교사학이 성행하면서 선도사학은 저류화되었으나 유가 쪽 역사인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단지 유교사서에 단군에 대한 기록이 실린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권람은 단군 이전 환웅천왕을 기록하였고, 허목은 환웅 신시씨에서 우리 역사가 비롯하는 것으로 보았다. 홍만종도 천신의 아들이 단군이라는 자신의 의견(按)을 밝혔다.
조선초기 권람은 응제시주(應製詩註)(1462)에서 선도적 사유체계가 실천되는 사회인 재세이화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선도적 역사인식이 영향을 미쳤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종휘는 『수산집(修山集)』(1803) 신사지(神事志)에서 비록 제천행사를 귀신숭배로 이해하고 서술하였으나, 신교(神敎:한국선도) 기원이 신시시대였음을 밝히고, 단군이 즉위하고 마니산에 참성단을 지어 항상 하늘에 제사를 지냈으며 제천 전통이 고구려까지 이어졌음도 기록하였다. 이종휘는 독단적인 유교 이데올로기에 빠진 다른 성리학자들의 태도와 달리 선도사서를 인용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홍만종과 이종휘는 단군의 치적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단군의 역사성과 실재성을 높임은 물론 단군조선이 상당한 수준의 문화를 가진 사회였다는 인식을 보여 주었으나 기자시대에 문화가 발전했다는 유교사관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또한, 태자 부루의 도산회합을 조(朝:알현)라고 기록하여 회(會:만남)로 기록한 선가의 자주적인 관점(檀君世紀)과는 달리 유학자의 사대적인 관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역사 정통의 계승에서 ‘부여’를 주목한 경우도 있었다. 허목은 『동사(東事)』에서 유교사학에서 정통으로 인정하는 ‘단군기자위만사군이부삼한(마한)신라’로의 계승과 더불어 ‘단군부여고구려’의 계승도 인정하였다. 이는 주자성리학을 거부하고 직접 고경(古經)의 세계로 뛰어들어 원시유학 본래 모습에서 유학 정신을 찾으려 하였던 허목이지만, 육경(六經:시경・서경・역경・춘추・예기・주례) 고학(古學)에만 얽매이지 않고 선도사서의 영향도 받았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사군 낙랑군 위치에 대해 김부식 이래의 ‘재(在)평양설’이라는 유교사학 통설과는 다른 흐름도 있었다. 조선초기 권람은 관구검이 현도군에서 출병하여 낙랑군으로 퇴각하였다는 사료를 들어 낙랑군이 요동 지역에 있었다고 보았다.(“東川王時 魏幽州刺史毌丘儉將萬人 出玄菟來侵...遂自樂浪而退...則樂浪非平壤明矣”, 응제시주)
조선후기 유교사학에서도 낙랑군이 있었던 고대 평양 위치에 대해서 정약용이 거론했던 것처럼 ‘재(在)요동설’이라는 흐름이 대두되었다.(“鏞案 今人多疑 樂浪諸縣 或在遼東”, 『아방강역고』)
북학파였던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낙랑군 조선현이 지금의 평양이 아닌 요양의 평양에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김경선(金景善:1788∼1853)도 『연원직지(燕轅直指)』(1833)에서 낙랑군 치소를 요양의 평양으로 보았다.
권람・허목・홍만종・이종휘는 모두 선도적 역사인식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농후하지만 중화주의 유교사관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민간에 있던 선도사서를 조정에서 강제로 수거하던 15세기에 비해 주자성리학 영향력이 더 확대되었던 16세기에도 선도사서의 명맥은 끊기지 않았다. 『단군세기』를 지은 행촌 이암의 현손 이맥은 가장(家藏) 사서와 내각(內閣) 비서(祕書)의 내용을 종합하여 『태백일사』를 편찬했다.
명・청 교체로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바뀌는 17세기에도 주자성리학은 정통론을 주창하며 굳건히 주류 사상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이 시기에도 존화 사대의식에서 벗어나서 고유의 종교・윤리・언어・전통을 지키며 민족 주체성・자존의식 보존을 강하게 주창하는 선도사서 『규원사화』가 저술되었다. 그러나 편찬자의 이름조차 밝히지 못하는 엄혹한 시대였다.(2)
남인 실학자들의 역사인식은 “조선후기 새로이 대두하던 고구려 중심의 역사관, 발해사를 우리 역사에 편입하려는 움직임, 국사 영역의 만주로의 확대, 고토회복 의식 등과 같은 새로운 역사학의 흐름(북학파는 대체로 이에 속함)과 대립되는 것이었다.”
민족사 관점에서는 남인 실학자들의 상고・고대사 인식이 유교사학에서 가장 퇴행한 것이었음에도 ‘식민사학주류 강단사학’으로 계승되었다.
■ [기고] 선도 홍익사관의 전승 과정 연구(6) 유교사학에서도 가장 퇴행적인 남인 실학자들의 고대사 인식
K스피릿 입력 2022.05.30 10:49 업데이트 2022.05.30 10:50
기자명 소대봉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연속된 국난으로 조선은 미개하다고 여겼던 왜와 청에게 나라가 망할 지경에까지 몰렸다. 그러나 지배세력인 유교 성리학자들은 신분제(身分制)나 공납(貢納) 등에서 드러난 사회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도 미약했다. 정통 성리학자들과 보수 세력의 끈질긴 저항으로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는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무려 100년이나 걸린 사실에서 이는 단적으로 드러난다.
양란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경험하면서 성리학은 국가・사회 지도이념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냈다. 명・청이 교체되는 17세기 중엽 대격변기는 동북아 세계질서 변화와 함께 세계관 변화도 요구하였다. 그러나 양란을 거쳤음에도 이단을 배격하는 주자성리학의 교조주의적 성향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남인 윤휴(尹鑴, 1617~1680)가 서인 주자학자로부터 ʻ사문난적(斯文亂賊)ʼ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고, 그로부터 40여 년 뒤에 박세당(朴世堂, 1629~1703)도 같은 죄목으로 목숨을 잃었던 사실에서 탈주자학적인 시도를 용납하지 않았던 당시의 시대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조선 지배 세력인 주자성리학자들은 어지러워진 사회 질서를 지배층 입장에서 재편성하고 대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밀한 예론(禮論)을 전개하였다. 양란으로 흔들리던 신분 질서를 주자성리학 이념으로 더욱 공고하게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정주(程朱)의 주소(註疏)를 교조적으로 따르지 않고 원시유학에서 유학정신을 새롭게 찾고자 하는 흐름이 형성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관념화・형식화된 주자학을 비판하면서 청나라의 앞선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조선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도를 찾고자 하는 흐름도 형성되었다.
명・청 교체의 대격변기가 지난 18세기 초에는 대명절의(大明節義)를 부르짖으며 청나라에 불복한다는 의미에서 국가 차원의 대보단(大報壇)을 설립하고 제사하는 등 중화계승의식이 형성되고 정통론이 강화되었다. 대부분 주자성리학자들은 중화질서가 붕괴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중화질서를 회복하려는 염원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 지배층은 조선을 중화의 유일한 계승자로 인식하고 ‘정통론’이라는 역사인식을 강화시켰다. 정통론은 중화(中華)와 이적(夷狄), 정통(正統)과 윤통(閏統)을 구별하는 전통적인 화이관으로, 도덕문명 정통성은 오직 중화족에게만 있다는 주장이다. 명나라가 멸망하고 천하에 오직 소중화인 조선만이 남게 되면서 조선에도 정통론의 적용이 가능해졌다.
비로소 조선이 중화라는 ‘조선중화주의’가 태동하였다. 청나라가 중원대륙을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도 ‘성리학적 중화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관념 속에서 도출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조선 고유 가치와 문화로부터 독자적인 중심주의를 도출한 것이 아니라 주자학적 보편주의를 충실히 따르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미 망한 명나라의 유교 문물을 인정한 위에서 그것을 계승・보전하는 것일 뿐이었다.
조선은 주나라 초기 기자가 문명을 전파함에서 시작했으며, 공자도 인정했듯이 처음부터 중화와 같은 수준의 문화전통을 간직한 문화국가였다는 인식이 더 확산되었다. 공자가 중화문화의 정수로 인정한 주(周)나라에 홍범구주를 전파한 은(殷)나라 현인 기자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를 보는 인식은 더욱 강화되었다. 대중화(大中華)는 현실에서 사라졌으나 소중화가 중화주의를 이었고, 소중화가 될 수 있도록 문명을 전달한 기자가 강조되면서 중화사관은 더욱 심화되었다.
한편으로는, 교조주의적 주자성리학에서 벗어나 공자의 원시유학에서 유학정신을 새롭게 찾고자 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 흐름도 조선중화주의와 마찬가지로 ‘화・이’라는 차등 관념을 전제로 한 문화적 화이관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문화적 화이관은 화이(華·夷)와 중외(中·外) 구분은 태어난 지역이 아니라 그 정치가 인(仁)하냐 학(虐)하냐에 따라 구별하여야 한다는 즉, 문화[인(仁)・의(義)・강유(綱維)・예법(禮法)]의 유무(有無)라는 층위에서 화와 이의 위계(位階)를 설정해야 한다는 청나라 제5대 황제인 옹정제의 대의각미록(大義覺迷錄)이론을 받아들인 것이다.
허목에서 시작된 고학(古學)은 주자성리학을 교조적으로 따르지 않고 고경(古經)을 통해 유학정신을 새롭게 찾고자 하는 흐름으로, 이익・정약용 등 경기남인의 학풍에 큰 영향을 미쳤다.
허목은 주자학을 반대하는 자리에 육경고학을 두었으나, 선도사서의 영향도 일부 받았다. 허목과는 달리 이익 이래 경기남인 실학자들은 선도사서를 철저히 배제한 위에서 육경고학에 관심을 두었다. 그런데 3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화사관은 공자의 원시유학에서 비롯되었으나, 중화문화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한 화이론적 인식은 오행의 중심에 통제점인 토를 놓고 제왕의 도를 주창한 요(堯) 시대에 이미 존재했었다. 육경(六經)이 태동하던 시기 이전부터 화이론적 인식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원시유학에 관심을 두고 화・이를 가르는 기준점을 문화의 층위(層位)에서 찾았던 남인 실학자들의 문화적 화이관에서는, 고대 조선을 공자도 인정하는 문명국으로 교화하였다는 기자에 대한 존숭(尊崇)은 더 강화되었고, 상대적으로 단군시대의 문화수준은 더 저열하게 인식되었다.
급기야 단군왕검의 역사적 실재를 부정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 안정복은 단군왕검의 사적은 모두 ‘터무니없고 근거가 없다(荒誕不經)’고 하였고, 정약용은 왕검(王儉)은 지명이었던 왕험(王險)의 ‘험(險)’을 ‘검(儉)’으로 바꾼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민족사 관점에서 본다면, 남인 실학자들의 상고・고대사 인식은 유교사학에서도 가장 퇴행한 역사 인식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관념화되고 형식화된 주자학을 비판하면서 배청숭명(排淸崇明)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청나라 문물을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하는 새로운 학풍이 나타났다. 노론계의 일부 소장 학자들이 중국 사행을 경험하면서 청나라에 수용된 서구문화를 직접 목도하고 확인하면서 큰 자극을 받은 데에서 나타난 것이다. 18세기 후반, 청나라를 야만시하고 적대시하던 이전의 태도에서 벗어나 청나라로부터 학문과 기술을 받아들여 조선 경제를 풍요롭게 하고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을 주장한 이용후생(利用厚生) 학파인 북학파가 등장한 것이다.
북학파는 그 시대의 모든 학술을 자유롭고 개방적인 자세로 이해하고 수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북학파는 객관적 지식체계 수립을 모색하여 서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도가와 불교 등 이단에 대해서도 섭취하려는 개방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었다. 연행하는 사신을 따라 청나라에 다녀 온 박지원이 보여준 고대 평양에 대한 인식(“漢樂浪郡治在遼東者 非今平壤乃遼陽之平壤”, 열하일기)은 그 개방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다.
조선후기 역사 서술은 주로 실학자들이 주도했다. 이 시기 사학의 특징은 정통론과 강목체의 유행, 경학(經學)으로부터 사학(史學)의 독립, 전문 역사학자의 출현, 개인 사서편찬의 증대, 역사지리학의 발전, 광범위한 사료수집과 문헌고증 중시로 인한 역사학 방법론의 발전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문헌고증 방식은 그다지 치밀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 많이 보이는 문제가 드러난다. 현지 지리를 살필 기회가 적었고 주로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였다고 하나 기실은 중국 문헌들을 자의적으로 이용・해석하고 민족 고유의 선도적 역사인식에 근거한 사서들은 철저히 배제한 결과였다.
실학(實學)은 조선후기에 자생한 자본주의적 요소와 신분제 변동에 대한 연구와 함께 근대의 기점과 근대사의 자주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930년대 정인보와 함께 ‘조선학 운동’을 주도한 안재홍은 ‘실학파’, 특히 정약용의 학문에서 근대성을 발견하려고 시도하였다. 안재홍은 정약용의 사상을 “근세 국민주의의 선구자”, “근세 자유주의의 거대한 개조(開祖)”로까지 평가하였다. 실학사상에서 근대적 경향을 찾아내게 되자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을 반박하고 조선의 주체적 근대화 맹아를 탐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학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평가로 인해 실학자들의 한국고대사 인식(역사지리 비정)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남인 실학자들의 역사인식은 “조선후기 새로이 대두하던 고구려 중심의 역사관, 발해사를 우리 역사에 편입하려는 움직임, 국사 영역의 만주로의 확대, 고토회복 의식 등과 같은 새로운 역사학의 흐름(북학파는 대체로 이에 속함)과 대립되는 것이었다.”
민족사 관점에서는 남인 실학자들의 상고・고대사 인식이 유교사학에서 가장 퇴행한 것이었음에도 ‘식민사학주류 강단사학’으로 계승되었다.
한영우는 “이병도의 한사군 연구는 결과적으로 한사군의 중심지가 한반도에 있음을 재확인하는 것이 되었다. 어쨌든 그의 학설은 오늘까지도 우리 학계의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한영우, 「이병도」,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하, 창비, 1994, 262쪽.)고 한다.
오영찬은 “한사군의 역사 지리에 대한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연구 성과와 방법론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연구과 이병도의 연구에 수렴됨으로써, 한국 고대사 체계의 정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오영찬, 「조선후기 고대사 연구와 한사군」, 《역사와 담론》 64, 2012, 2~3쪽).
송호정도 “이병도의 역사지리에 대한 관심은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이나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 이케우치 히로시(池內宏) 같은 일본인 스승으로부터 배운 바가 컸다. 한편, 이병도의 고조선 및 한사군, 삼한과 관련된 역사지리 연구는 한백겸과 안정복, 특히 정약용 같은 조선후기 실학자들이 많이 고민하였던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되었다.”고 하였다(송호정, 「실학자들의 역사지리관과 고조선 한사군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62, 2011, 50쪽). 따라서 식민사학으로 계승되었다는 남인 실학자들의 고대사 인식에 대해 조금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3)
<자료출처>
(1) 고대사 중심무대를 한반도로 축소한 김부식과 중화사관 도입 - K스피릿
(2) 유교사학은 한국 고대사의 왜곡에서 출발 - K스피릿
'우리겨레력사와 문화 > 우리겨레 력사학자, 력사서(1)'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리겨레 력사학자, 력사서 (22) 단군시대를 폄하한 이익과 안정복/ 단군왕검마저 부정한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오로지 중국인의 시각으로 고대사를 바라본 한치윤・한진서 (9) | 2025.04.04 |
|---|---|
| 우리겨레 력사학자, 력사서 (20) 홍익사관은 共生의 역사관/ 선도사학으로 바라본 한국 고대사/ 중화사관, 힘의 질서 중시하는 패권주의 (10) | 2025.04.03 |
| 우리겨레 력사학자, 력사서 (19) 신경준(申景濬) 강계고(疆界考) (12) | 2025.03.05 |
| 우리겨레 력사학자, 력사서 (18) 유형원 (柳馨遠) 동국여지지 (東國輿地誌) (19) | 2025.03.04 |
| 우리겨레 력사학자, 력사서 (17) 한백겸(韓百謙) 동국지리지(東國地理誌) (6) | 2025.03.04 |





